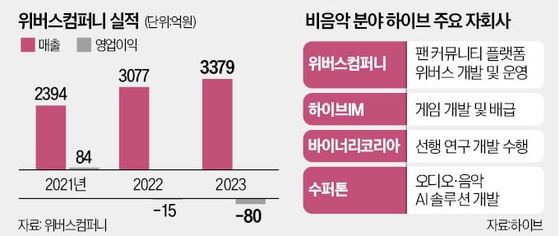[책마을] 지인들이 본 법정스님의 인간적 면모와 일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책마을] 지인들이 본 법정스님의 인간적 면모와 일화](http://editor.hankyung.com:7001/photo/ImageSprayer.jsp?kind=CART&aid=2012011260681&indate=&photoid=201201121452&size=1)
불교방송 진행자로 잘 알려진 진명 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의 회고다. 2년 전 입적한 법정 스님은 이렇듯 매사에 철저하고 정확했다. 그런데도 진명 스님은 법정 스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었다.
한번은 법정 스님이 “정진하고 있는데 불쑥불쑥 ‘법정 스님 계십니까’ 하고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통에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명 스님은 말 끝나기가 무섭게 “스님! 그게 싫으시면 글 쓰지 마세요. 글을 쓴다는 건 사람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도 많은 고민 끝에 어렵사리 찾아오는 건데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 취급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라고 퇴박을 놨다. 법정 스님은 “진명이 말이 맞다”며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법정, 나를 물들이다》는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열린 법정 스님의 법회 진행을 12년 남짓 맡았던 저자가 법정 스님과 교유했던 지인 19명을 일일이 찾아가 생전에 맺은 인연과 인간적인 면모, 일화 등을 전해준다.
천주교 신자인 조각가 최종태, 찻잔으로 인연을 맺은 도예가 김기철, 그림으로 시를 쓰는 화가 박항률, 성철 스님의 제자인 원택 스님, 농사꾼으로 변신한 방송인 이계진, 종교의 벽을 허물고 30여년간 교유한 전 천주교 춘천교구장 장익 주교, 20여년 동안 법정 스님의 어머니를 모신 사촌동생 박성직 등 지인들이 기억하는 법정 스님의 면모는 닮았으면서도 제각각이다.
김기철 씨는 법정 스님의 법문과 글에서 영화, 책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소개된 계기를 소개한다. “한번은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 전기 《첼리스트 카잘스, 나의 기쁨과 슬픔》을 소개해 드렸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글로 쓰셨더라고요. 그 뒤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란 헬렌 켈러 자서전을 보내드렸더니 신문 칼럼에 쓰셨어요. 스님한테 보내 드리면 좋은 책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구나 싶어 헬렌 니어링이 쓴 책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도 보내드렸죠.”
장익 주교는 “법정 스님은 견성을 하면 그 순간 불자이길 그친다고 하셨다. 불자의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종교가 참삶을 찾아보자는 궁극에 이르는 수단으로 애를 쓰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아주 확신하셨다. 저도 상당히 공감한다”고 했다.
저자는 “법정 스님은 지인들을 당신의 색깔로 물들인 게 아니라 재료의 성질을 살리면서도 맛을 더해주는 양념처럼 교유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레깅스 입고 퇴근하기 민망했는데…" 직장인들에 인기 폭발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9937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