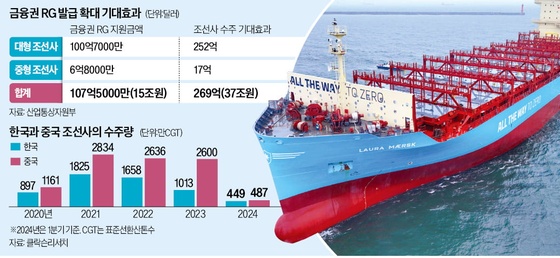[시론] 'IMF 부동산 처방' 맹신할 필요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금 올리면 주택 공급 감소
대출 막히면 불법 사금융 의존"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시론] 'IMF 부동산 처방' 맹신할 필요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7.27070873.1.jpg)
사실 지난 2년간 한국의 주택 보유 비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2022년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020년 대비 40%나 상승해 보유세 부담 증가에 기여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도 해마다 늘어나 2021년에는 주택 보유자의 6%가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다. 이렇게 주택 보유 비용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 수요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은 주택 가격이 이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집값이 더 오르면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심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매를 부추겼다. 주택담보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9년 4분기에는 4.3%였으나 지난해 4분기에는 8.8%까지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신용대출을 이용하거나 갭투자를 활용한 주택 매입이 줄을 이었다.
급기야 자금 여력이 부족해 주요 주택 매입 계층에서 비켜나 있던 2030세대마저 ‘영끌’로 주택 구매에 나섰다. 2019년 초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30대 이하가 차지한 비중은 30%에 미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이들의 비중이 40%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신규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예상은 한편으론 현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해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 데 기인한다. 이와 함께 주택 보유세를 인상하는 정책도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줄여 이런 예상을 뒷받침했다. 2021년 한국경제리뷰(Korean Economic Review)에 실린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 보유세 상승으로 가계가 주택보다 금융자산으로 눈을 돌리면 경제 내 자본 축적이 가속화하는데 이는 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을 부흥시키는 반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은 건설업은 위축시킨다. 즉, 장기적으로 보유세 인상은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더할 뿐이다.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IMF의 처방 역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여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출 총량 규제까지 총동원한 현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정책이 일견 효과를 내는 듯하다. 하지만 대출 수요 증가의 원인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을 크게 늘리고 제도권 대출이 막힌 가계는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조일 대로 조인 가계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보다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시작돼 이로 인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신규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말이다.
2010년 당시 IMF 총재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정책 처방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IMF의 부동산 정책 제안은 참고자료일 뿐 맹신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시론] 글로벌 패권 시대 '통상 선진국' 되려면 …](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7.29455760.3.jpg)
![[시론] 전기차의 핵심 이슈가 이동하고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7.24937175.3.jpg)
![[시론] '과학기술 강국 G5' 도약하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7.24315952.3.jpg)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