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증시 받치는 기업 실적과 소비, 이런 게 '튼튼한 기초체력'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미 증시 활황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도 있지만,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 호조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S&P500 종목의 78%가 1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 개인 소비지출(3월)은 전달보다 0.9% 늘어 9년 반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분기 깜짝 성장(연율 3.2%)에도 물가 상승률은 1.6%에 그쳤고, 채권 금리도 안정적이다. 올초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폐쇄)과 경기침체를 걱정했던 게 언제였나 싶다. 최근 상황을 2000년대 중반의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태)’에 비유할 정도다.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
반면 우리 경제는 총체적 무기력에 빠져들고 있다. 성장 후퇴(1분기 -0.3%) 속의 물가 안정은 전형적인 불황 징후다.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투자·소비가 반등했지만, 이는 회복 신호라기보다 비교시점인 2월 지표가 워낙 안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봐야 할 것이다. 1분기 전체로는 소비(1.3%)만 늘었을 뿐, 생산(-0.8%)·투자(-5.4%) 부진이 심각하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10개월째 동반 하락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성장엔진이 식어가는데 좋은 지표만 골라서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민간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활력이 생긴다”고 언급한 대로, 경제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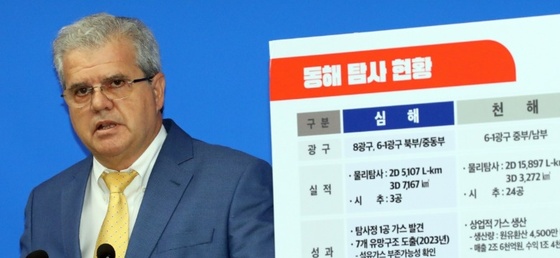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반나절 만에 3,200억 원 손실…시장 흔든 트레이더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8064644263.jpg)








![[고침] 문화([신간] 병자호란과 삼전도 항복의 후유증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6860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