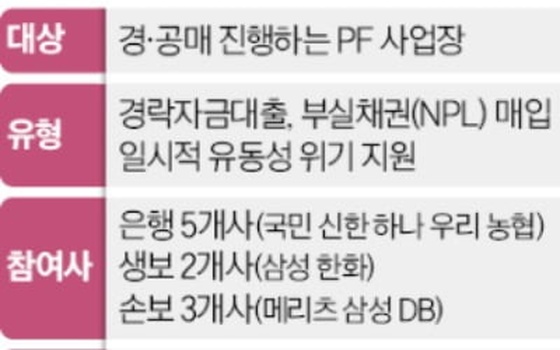입력2006.04.02 10:34
수정2006.04.02 10:36
신용카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화두(話頭)로 떠올랐다.
거듭되는 수출 부진속에서 국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내수 확대의 첨병이라는 찬사와 함께 무리한 시장 확대로 인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카드산업에 대한 정부의 최근 정책에도 양면성이 담겨 있다.
학원 병.의원 로펌 등 카드 사용 사각지대에 대한 카드결제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조장(助長)'과 모집 제한 등 '규제'가 뒤섞여 있다.
이처럼 세간의 평가나 정부 정책에 모순이 있는 것은 카드산업과 관련 시장이 '압축적'이라 할 만큼 초고속 성장가도를 달려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1998년만 해도 63조5천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는 4백81조8천억원으로 불어났다.
3년만에 시장규모가 7.6배나 급팽창한 것.올해는 6백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신용카드를 통한 민간소비 비중도 98년의 12.7%에서 지난해엔 34.9%(9월말 기준)로 급등했다.
이같은 신용카드산업의 고속 성장은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우리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두자릿수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3%대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신용카드에 뒷받침된 내수 확대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신용카드는 또 하도급 중소기업들을 만성적인 자금난으로 내몰았던 어음 등 전근대적 결제방식을 없애는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처럼 내수가 한국 경제를 살리고 있는데는 카드업체들의 무이자 할부 등 공격적인 영업전략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카드복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카드사용 촉진정책을 편 것도 시장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98년 51만명이었던 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지난해 71만9천명(전업사 기준)으로 늘어나면서 '카드 과잉'에 대한 일부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카드사용이 건전한 소비를 넘어 과다한 소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
!["완전 만족했다"…침착맨도 극찬했는데 '이럴 줄은' [신현보의 딥데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N.36640747.3.jpg)

![[포토] ‘지역 맞춤형 특화매장’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목동점 재단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19475.3.jpg)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