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前 과기처 장관 "좌우 이념 갈등에 꼬인 대한민국 정체성 바로잡아야"
김진현 前 과기처 장관
"우리나라 정체성 뿌리는 3·1운동
다양한 논의로 현대사 정립하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번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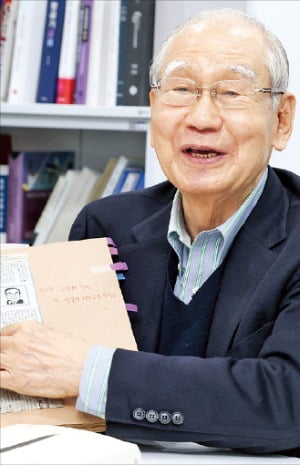
지난 7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만난 그는 “후세대를 위해 내 자랑, 내 궤적의 나열보다 내가 보고 겪은 것을 과오와 실수까지도 솔직하게 남기려 했다”고 말했다. 나라의 원로라면 회고록을 통해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1936년생인 그는 만 31세의 나이로 최연소 동아일보 논설위원에 올랐고, 이후 과학기술처 장관, 한국경제신문 회장, 서울시립대 총장, 환경운동연합, 문화일보 사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극심한 이념 갈등 등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한국 사회의 문제들이 6·25전쟁 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꼬인 데서 시작됐다고 진단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1919년 3·1운동에서 시작합니다. 그해 4월 수립된 상하이임시정부도 3·1운동 정신을 계승했지요. 해방 후 항일독립운동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돼야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초기만 해도 그 정신이 지켜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다양한 독립 세력들이 내각과 국회에 참여했고, 일제강점기 때 관료였던 사람들은 고위직에서 배제됐다. 특히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백범 김구계 인사들도 거의 다 출마했다. 김규식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5일 뒤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됐다. ‘중간파’로 분류됐던 조소앙, 안재홍, 김규식 등이 대거 북한에 납치돼 끌려갔다. 전쟁통에 정부를 운영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때 관료 등으로 일한 사람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 최규하 홍진기 민복기 등이다. 그는 “6·25 난리를 거치면서 묻혀 있던 논란이 1987년 민주화 이후 다시 불거지면서 지금까지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5~2011년 제헌의원유족회 창립회장을 맡았던 그는 유족들이 가졌던 한(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는 “대한민국은 항일독립운동하던 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며 “나라의 엘리트들이 사욕만 채우고 이들을 돌보지 않은 것은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본의 아닌 납북도 억울한데, 아버지가 북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원조회에 빨간 줄이 쳐지고, 여권도 못 얻어 해외 유학도 못 하고,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에 취직이 안 됐습니다. 반대로 친일파로 보이는 이들의 자식들은 고등고시로 공무원이 돼 출세하고, 유학 가서 박사 학위도 받고, 고관대작 대접을 받았지요.”
자신들의 치부 탓인지 한국에선 오랫동안 학교에서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 빈 공간을 극단적인 좌파 역사학자들이 채웠다. 이승만을 비롯해 과거 인물들을 다 친일파로 몰아붙였고, 혼란이 더욱 커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반대로 우파는 이승만을 지나치게 영웅시하고 김구를 폄훼했다. 보수우파인 백범을 좌파 쪽 인물로 만드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렇다고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정부를 앞세워 국정교과서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에서 먼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현대사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어떨까. “역사의 사이클을 믿는 사람들의 관찰에 따르면 문화와 예술이 전성기를 누리면 그 나라는 이제 내리막을 걷습니다. 안정적인 정치를 기반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예술이 번성하면서 마지막 사이클에 접어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도 끊임없이 개혁하고 창조하면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습니다.”
글=임근호 기자/사진=허문찬 기자 eig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금지 '직격탄'...인텔 2.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90647304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