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6:23
수정2006.04.02 16:29
소설가 이문구씨의 장편소설 "매월당 김시습"(문이당,1만5백원)이 재출간됐다.
지난 1992년 첫 출간 당시 역사소설 붐을 타고 10만권 가까이 팔린 "매월당 김시습"은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의 삶을 다룬 전기(傳記) 소설이다.
한문과 고어투의 표현이 많아 17세기 고전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씨가 20개월에 걸쳐 집필했다는 이 작품은 문장 하나하나 공들인 기색이 역력하다.
"그것도 모르다니 명주바지에 삼베버선일세" "알려줘봤자 식은죽 먹고 더운물 마시는 격이지"등 해학적이고 토속적인 표현이 많다.
소설은 50대의 김시습이 벼슬길을 버리고 팔도를 떠돌던 중 설악산을 오르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도 걸었다.오늘도 어지간히 걸었다.오늘도 걷는 것이 일이었다.그러나 고단하였다.길은 늘 험하였다.공로(公路)가 아닌 탓이었다.지름길을 찾은 일도 없었다.
하나도 바쁠 것이 없는 길이었으니까.길은 매양 호젓하였다.말 뒤에 가마가 따르고,가마뒤에 나귀가 따르는 길은 한사코 꺼려온 까닭이었다"
김시습은 태어난지 8개월만에 글을 알고 3세에 시를 짓고,5세에 승정원에 업혀나가 시운을 주고 받았던 신동이었다.
그는 별명이 오세(5세)일 정도로 일찍 문명을 날렸지만 세조가 어린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것을 보고 세상을 등진 채 유랑길에 나선다.
김시습은 "산을 보면 높음을,물을 만나면 맑음을,돌에 앉으면 굳셈을,달을 보면 밝음을 배울 일"이라며 시대에 편승해 일신의 안녕을 도모하는 사람을 꾸짖었다.
"물 한 쪽박 찬밥 한술이라도/거저 먹지 말며/한 그릇을 먹었으면/한 사람의 몫을 하되/모름지기 의로움의 뜻을 알라."
김시습은 왜 관직에 나오지 않느냐는 물음에 마음을 비웠다고 말한다.
김시습의 마음을 달랠수 있는 것은 시 뿐이었다.
오늘날 그가 남긴 시는 2천2백여수에 달한다.
작가 이문구씨는 김시습을 통해 당대 권력을 비판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토지제도 중의 하나인 직전법은 관리가 벼슬을 받으면 나라로부터 땅을 받고,벼슬에 물러날때는 땅을 반납하도록 한 것이다.
관리들은 벼슬이 떨어져 땅을 돌려주기 전에 한 가마니라도 곡식을 더 거둬들이려고 작인들을 착취했다.
공신들에게 주는 공신전도 문제였다.
공신이 되면 땅도 받고 자식들의 벼슬길도 열리므로 서로 공신이 되려고 남을 모함하기에 일쑤였다.
김시습 말년에 보위에 있었던 성종의 경우 공신이 75명이 되었으니 그만큼 많은 수가 역적이 되어 죽음을 면치 못했다.
단종비 또한 역적이 되어 신숙주 집의 노비가 될뻔했다고 한다.
작가는 이같은 옛이야기를 통해 현실의 권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덧없는 인생에 갈 길은 많지만 저승으로 난 길만은 똑 같다"고 말하기 한다.
소설 "매월당 김시습"은 인간 김시습의 여러가지 측면을 조명한 작품이다.
현실비판적 요소와 내면성찰의 깊은 맛을 두루 느낄 수 있다.
윤승아 기자 ah@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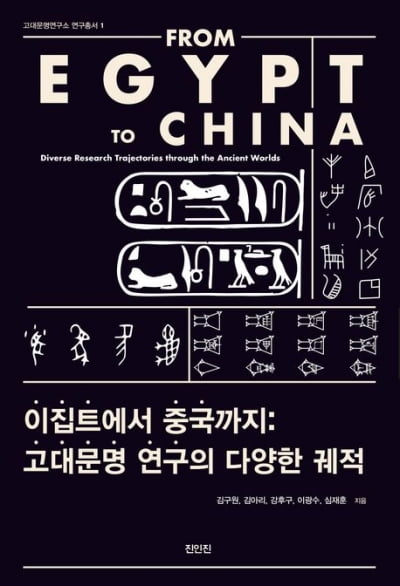


![월가 '대장 개미' 트윗 한 줄에…밈 주식 동반 폭등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14073731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