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데스크] CEO들의 씁쓸한 '사죄행렬'
![[한경데스크] CEO들의 씁쓸한 '사죄행렬'](https://img.hankyung.com/photo/201403/02.6926792.1.jpg)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1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황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황 회장이 작년 12월 내정된 뒤 KT와 삼성전자가 어떤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지는 재계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다. 이석채 전임 회장은 2009년 말 애플 아이폰을 국내에 들여와 삼성의 ‘방어본능’을 자극하고 틈틈이 독설을 주고받았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애플과 일합을 겨룰 만한 전열을 갖추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협력적 관계는 아니었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 평가다.
곤경에 처한 '황의 법칙'의 꿈
작년 말 이석채 후임으로 황창규가 거론될 때 한 친박(親朴)계 인사는 “KT 회장 선임을 지켜보면 재밌는 게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새 회장이 낙점됐을 때 “전문성 있는 자리에 정치권 낙하산은 없다는 것을 알리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이 인사의 장담대로 소문이 난무했던 포스코 회장 자리엔 전문성을 인정받은 내부 인사가 발탁됐고, 금융권을 장악해온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은 맥없이 밀려나고 있다.
황 회장이 처한 곤경은 그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제인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고,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인사실험’ 격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혁신의 뜻을 펴보기도 전에 수년간 쌓여온 잘못을 사죄하고 수습해야 하는 난제부터 떠안았다. 황 회장 스스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를 폭탄에 포위돼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하는 한국 최고경영자(CEO)들의 숙명을 동병상련처럼 절감하고 있을는지 모른다.
해커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조간신문 1면에 잊혀질 만하면 등장하는 사과광고는 역설적으로 우리 기업과 CEO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잘 보여준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CEO, 대형 사고현장에서 진땀 흘리는 오너 경영자, 검찰로 불려가는 임직원들은 흔히 볼 수 있는 풍속도가 돼 버렸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리스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CEO도 만나봤다.
KB 등 카드회사와 KT 같은 대기업에서 일어난 고객정보 유출사건, 임직원 비리는 아무리 강하게 질책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업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경비 절감을 이유로 지나치게 협력사로 부담을 떠넘기다 화를 자초하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원인을 찾아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잘 세워 경영 최우선 순위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에만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건 아닌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해커들이 기업 전산망을 놀이터처럼 가지고 놀아도 정부 대책은 감감 무소식이다. 10년 새 세 차례 고객정보를 강탈당한 KT는 올해 초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보안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둑맞았다고 기업들만 탓할 게 아니라 국민 재산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가 해커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하는 게 옳다.
유근석 편집국 부국장 yg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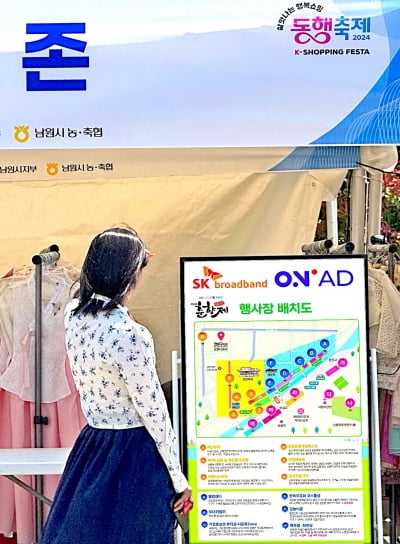


![물가 지표 초읽기…다시 파월의 시간이 온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31109084118397.jpg)




![[속보] 與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5/38978c85f64995796d4617116d0b761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