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그대로 가면…영세농 자기 인건비 빼고 순수익 1% 남아
대형 농가는 25% 수준으로 '선방' 예상
정부, 4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유력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했을 때 0.5ha 미만 논을 경작하는 영세 농가의 순수익률이 2021년 22.9%에서 2030년 1.4%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순수익은 총수입에서 비료비, 농약비, 영농광열비, 토지 임차료, 자기 임금을 포함한 총 인건비 등을 포함한 생산비를 뺀 개념이다.
이는 2021년 80kg에 22만원 수준이었던 산지 쌀값이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2030년에는 17만2700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다. 생산비는 아직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지 않은 2021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반면 7~10ha의 농지를 갖고 있는 대농들은 이들보다 충격을 덜 받는다. 같은 기간 대농의 순수익률은 41.8%에서 25.6%로 낮아진다. 1~1.5ha를 재배하는 중농의 순수익률도 35.8%에서 17.9%로 떨어진다. 쌀 의무매입이 전반적인 농가들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가운데, 재배면적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는 구조다.
이같은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쌀 농사가 가진 ‘규모의 경제’적 특성 때문이다. 쌀 농사는 기계화율이 99.3%에 달한다. 토지가 늘어도 노동력 투입은 덜 할 수 있어 재배면적이 커질 수록 생산비가 떨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 기준 재배 면적 0.5ha미만 농가의 10a당 생산비는 108만2000원이었지만, 5.0ha 이상 농가의 생산비는 76만3000원으로 30%가량 낮았다.
2021년 기준 전체 농가(102만3000가구)중 51.9%인 53만5000가구가 0.5ha 미만을 가진 영세농이다. 1ha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그 비중은 73.2%에 달한다. 반면 5ha 이상을 가진 대농은 3만6000가구로 전체의 3.5%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매입의 의무화됐을 때 자본력이 있는 대농은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재배면적을 늘려 총수익을 늘릴 유인이 생긴다”며 “그 피해는 70% 이상의 중소농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전망이다. 극회로 돌아간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 의석수가 전체 의석의 3분의1이 넘는 115석인 점을 감안하면 재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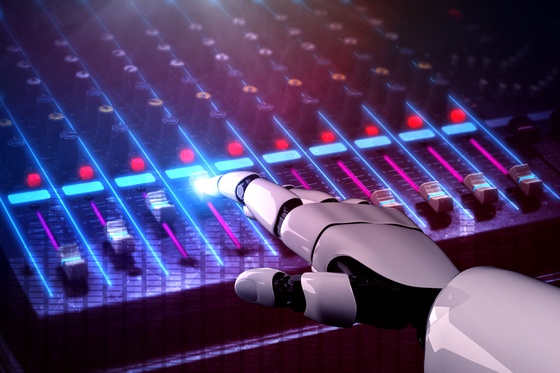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이아침의 사진가] 영화같은 사진의 대가…알렉스 프레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86770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