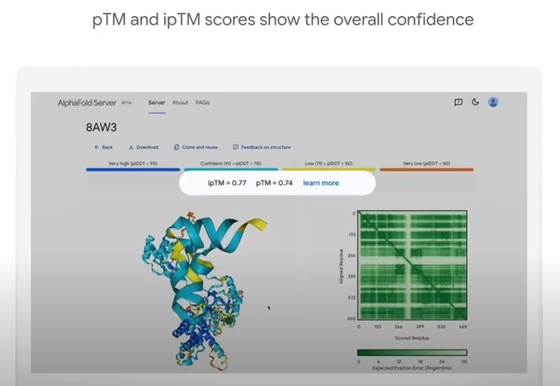[금호, 결국 대우건설포기] "생명·터미널지분 팔아 매각손실 메우겠다"
회사채 상환 유예해주면 그룹 정상화 가능
금호아시아나는 2006년 6월 미래에셋 등 18개 재무적 투자자(FI)를 끌어들여 대우건설 지분 72%를 주당 2만6262원(총 6조4255억원)에 사들였다. 금호 측 지분은 33%이고 FI 지분은 39%다. 대신 올해 말 주당 3만2450원에 FI의 지분을 되사주겠다는 풋백옵션을 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건설을 팔게 되면 매각 손실이 불가피하다.
지난 26일 대우건설 종가는 1만2850원이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감안할 경우 매각 가격은 1만6700원 정도가 된다. 만일 금호아시아나 지분 33%를 이 값에 판다면 주당 9560원(총 1조136억원)가량의 매각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에 FI에 보장한 풋백옵션도 지분 매각에 관계없이 이행해야 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1만6700원을 받고 FI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풋백옵션 행사가격과의 차액은 2조여원에 달한다. 현 주가 수준에서 대우건설 지분 72%를 팔 경우 최대 3조여원의 매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주가의 변동성을 감안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쳐줄 경우 매각 손실은 2조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이 손실을 금호생명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38.7%) 등 자산 매각을 통해 메울 수 있다고 밝혔다. 금호생명의 경우 칸서스자산운용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매각을 추진 중이다. 매각가격은 3000억~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서울 반포동에 있는 8만7111㎡ 규모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공시지가가 1조원을 웃돌고 있어 4000억원 안팎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유통업체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아시아나IDT와 금호오토리스 등을 매각해 이미 확보해둔 자금과 일산대교 등 사회간접자본(SOC) 주식 매각 대금(1500억원),한국CES 대한송유관공사 등 투자 유가증권 매각 대금(1000억원),대불단지 등 기타 자산 매각 대금(1000억원) 등을 합치면 이만한 손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금호 측 설명이다. 관건은 자산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냐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조5000억원의 회사채 상환도 변수다. 금호아시아나는 자산 매각 외에 자산유동화증권(ABS)과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이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대우건설 매각 손실 등을 감안하면 채권단의 회사채 상환 유예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옥과 금호생명 등 주요 계열사까지 매각하며 대우건설 구하기에 나섰던 금호아시아나가 결국 3년 만에 대우건설을 되파는 것으로 손을 든 것은 그룹 전체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인수 기업을 3년 만에 시장에 내놓는 것은 기업 인수 · 합병(M&A) 시장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매각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번지면서 주요 기업과 금융권이 자금난을 겪게 된 게 주요 원인이 됐지만,FI를 무리하게 끌어들여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에 이어 대한통운을 4조1000억원에 인수하며 단숨에 재계 7위 그룹으로 도약했지만 빚을 내 몸집불리기에 나선 대가는 만만치 않았다. 적지 않은 금융비용을 갚느라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은 물론 계열사들까지 각종 루머에 휩싸이는 등 M&A 후유증에 시달렸다. 대우건설 매각 후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계 순위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결국 호경기 때 뜨겁게 달아오른 M&A 시장에서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무리하게 투자자를 끌어들여 몸집불리기에 나섰던 게 화근이 된 셈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금지 '직격탄'...인텔 2.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90647304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