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잃는 환자에 '빛' 선물…"부작용 없는 인공망막 개발 눈앞"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명의를 만나다
변석호 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
손꼽는 망막질환 권위자
연간 1만명 환자 돌봐
국내 0.1% 희소질환자
노바티스 신약 투입
고도로 예민한 시술
실명 위기 20대 살려
AI·오가노이드 新기술
습득하는 '얼리 어답터'
끝없이 연구하고 논문써
망막 손상땐 재생 불가
평소 한쪽씩 눈 가려
시야 결손 확인해야
변석호 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
손꼽는 망막질환 권위자
연간 1만명 환자 돌봐
국내 0.1% 희소질환자
노바티스 신약 투입
고도로 예민한 시술
실명 위기 20대 살려
AI·오가노이드 新기술
습득하는 '얼리 어답터'
끝없이 연구하고 논문써
망막 손상땐 재생 불가
평소 한쪽씩 눈 가려
시야 결손 확인해야

2021년 변석호 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에게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 A씨의 말이다. 시술 당시 29세였던 A씨는 레버 선천성 흑암시라는 희소질환 탓에 두 살 때부터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빛이 환한 낮엔 흐릿한 시야에 기대 행동은 느려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A씨에게 두려운 것은 밤이었다. 어둠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해질 무렵 어스름한 저녁에만 확인할 수 있는 노을이 A씨에겐 ‘상상 속의 존재’였던 이유다.
변 교수는 A씨에게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의 럭스터나를 활용해 노을의 아름다움을 선물했다. 변 교수가 시행한 시술은 당시 국내에서 이뤄진 두 건의 임상 시술 중 한 건이었다. 전신마취한 A씨의 한쪽 눈에 구멍을 뚫고 유리체를 걷어낸 뒤 약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얇아질 대로 얇아진 망막은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손상될 수 있었다. 숨도 크게 못 쉴 정도로 조심히 시술이 이뤄졌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A씨는 저녁에도 부축 없이 다닐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망막 환자에게 ‘세상의 빛’ 선물한 의사

망막은 눈에서 가장 뒤쪽에 얇은 막 모양으로 있는 신경조직이다. 빛에 대한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꿔 뇌에 전달한다. 물체의 상이 맺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과거 카메라로 치면 ‘필름’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디지털카메라로 비유하면 전자결합소자(CCD) 이미지센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A씨가 앓았던 레버 선천성 흑암시와 망막색소변성 등 유전성 망막이영양증은 유전자 이상 탓에 빛 자극을 감지하는 망막세포 기능이 점차 떨어져 시력을 잃는 질환이다. 유전성 망막이영양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만 300개가 넘는다. 300가지 넘는 각기 다른 질환이 있다는 의미다.
변 교수가 안과 분야 최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얼리 어답터’가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를 찾아오는 망막 환자들은 점차 세상의 빛을 잃고 시력을 상실해 암흑 속으로 빠져갔다. 보지 못하게 되는 환자를 마주하는 것 자체로도 큰 고통이었다. 이런 환자를 보다 보니 자연히 더 앞선 기술을 찾아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실명 환자 돕기 위해 기술 개발도
럭스터나는 300가지 넘는 원인 유전자 중 1개(RPE65 유전자)에만 듣는 치료제다. 국내엔 이 유전자를 가진 환자가 0.1%에 불과하다. 한국인에게 많은 EYS 유전자는 유전자 그룹이 크고 동물모델도 없어 치료제 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변 교수는 망막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EYS 유전변이 환자를 위한 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시세포가 빛을 받으면 전기신호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 이온채널 등 막단백질을 활용한 치료제 연구를 진행 중이다.공대 교수와 함께 인공망막 기술 개발에 뛰어들어 성과도 냈다. 액체 금속을 활용한 소프트 인공망막을 개발해 올해 1월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망막질환으로 실명한 환자의 시력 회복을 위해선 인공망막 장치를 망막이나 뇌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 기존에 개발된 장치는 딱딱한 금속 재질의 전극으로 이뤄져 망막과 뇌처럼 부드러운 신경조직에 삽입할 때 손상이 생겼다. 인공망막 이식 때 생긴 흉터 탓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기존에 상용화된 인공망막 장치를 의료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변 교수가 개발한 소프트 인공망막을 실명한 쥐에게 이식했더니 빛을 받은 부분에서 4배 많은 망막 신호가 나왔다. 기존 장치보다 신호전달 효율은 2배 정도 높았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사람 대상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소프트 인공망막 장치는 망막조직 손상을 줄이고 전극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접촉시킬 수 있다”며 “실명 환자를 위한 맞춤형 인공망막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변 교수가 인공망막 연구를 시작한 것은 세계 최대 안과병원으로 꼽히는 영국 무어필드안센터에서 연수받던 2017년이다. 이후 국내 첫 망막 오가노이드 연구소를 열었다. 망막 연구를 늘리기 위해선 ‘인공 장기’ 역할을 하는 오가노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한쪽 눈 가리기’로 시력 확인해야”
그는 과거 시세포의 코스트로스트층 성격을 규명해 세계 표준용어를 만들었다. 그동안 묻혀 있던 ‘미지의 영역’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한 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의 한 안과 의사가 연관 논문만 10여 편 썼을 정도다. 한국형 황반변성의 진단적 특징도 규명했다.하지만 이런 연구 성과에 대해 그는 ‘과거의 영광’이라고 일축했다. 망막 환자를 위한 유전자 치료제가 등장하고 인공지능(AI) 덕에 진단 기술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등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황반변성은 이 같은 기술 개발로 치료법이 180도 바뀐 질환이다. 과거 황반변성 환자는 레이저 치료를 했다. 황반 주변부에 레이저를 쫴 실명 시기를 늦추는 방식이지만 실명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변 교수가 세브란스병원 조교수로 근무하던 2008년 그의 스승인 권오웅 교수가 직장암 치료제를 황반변성에 쓰는 첫 주사 치료를 시행했다. 이 치료가 표준으로 자리 잡은 뒤 레이저 치료는 자취를 감췄다. 최근 변 교수가 돌보는 환자 상당수는 황반변성 등 망막질환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환자다. 그는 “황반변성은 15~20년 전엔 당뇨 합병증이 많았지만 최근엔 당뇨 관리가 잘되면서 환자가 크게 줄었다”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늘고 있다”고 했다.
황반변성은 50대부터 시작해 열 살이 늘 때마다 4배씩 환자가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변 교수는 80대도 다른 신체가 건강하다 보니 눈이 안 보이게 되면 과거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신경조직인 망막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외래 환자를 보다 보면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환자가 많아요. 다른 쪽 눈으로 사물을 보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평소에 눈 이상을 확인하려면 한쪽 눈씩 가려 시야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시야가 가려지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 약력
1997년 연세대 의대 졸업
2006년~ 연세대 의대 안과학교실 교수
2015~2017년 세계 망막이미징심포지엄 초청연사
2016년 미국 밴더빌트안센터 연수
2017년 영국 무어필드안센터 연수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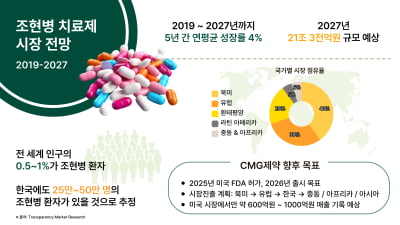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