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원>버나드 맬러머드 (을유문화사)

내게 따르는 기쁨과 슬픔이 모두 필연이고 숙명이라면 내딛는 걸음마다 이 걸음이 다음 걸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골몰하느라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일조차 쉽지 않을 것 같다. 모리스는 55년 평생 동안 필연과 숙명의 굴레에 시달려 왔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가 미국으로 망명한 유대인이라는 점에서, 이유 없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고객들을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와중 식료품점 가게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모리스는 내일의 불행과 고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오늘의 잔혹한 필연들을 매일같이 뒤돌아보며 살아왔다. 그는 이다음을 생각하느라 당장의 걸음을 내딛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스무 해가 넘는 그의 시간은 작고 낡은 가게에 잡아먹혔다.
“그는 모리스 보버였고, 운이 좀 더 있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을 거다. 그 이름을 가진 이상, 재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질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피와 역사에 소유하지 말라고 쓰여 있는 듯이, 혹은 기적적으로 뭔가 소유한다면 곧바로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듯이. 결국 (모리스는) 이제 예순 살이고, 서른 살 때보다 가진 게 없었다.”(27쪽)
모리스 보버는 가게에 들어앉아 촘촘한 생각들에 사로잡힌다.
나는 유대인이야. 새로 온 점원은 수상하나 불쌍해 내쫓을 수 없다. 사람들은 유대인을 싫어하지. 비유대인 점원이 카운터에 있으니 매출이 늘어나는구나. 나는 딸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내는 점원을 내쫓으라지만 어쩐지 아직... 외상값이 벌써 한도 초과이지만 한 번 더 내어 준다. 나는 상관을 속이고 탈출한 유대인이다. 점원에게 탈출기를 털어놓아 보기도 하는. 이번 주도 빠듯하지만 지난 주보다 조금 나빠지거나 조금 좋아졌다...
“그는 모리스 보버였고, 운이 좀 더 있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문장처럼, 모리스 보버가 시달리는 촘촘한 생각들은 모리스라는 한 사람을 더욱 자세히 완성시킨다. 사람들은 모리스 보버를 보고 그와 대화하며 그가 다름 아닌 모리스 보버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필연과 숙명은 그를 지독하게 괴롭혔지만 필연과 숙명 안에서 해낸 촘촘한 생각과 실천들이 모리스 보버의 지극히 사소한 행동에마저 그라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특성을 부여해 준 것이다. 다름 아닌 모리스 보버가 된 모리스 보버. 이것을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는 그저 모리스가 모리스로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작은 가게 안에서 시간을 곱씹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을 읽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우연히’ <점원>을 만났다. 아직 올해가 두 달 좀 넘게 남았지만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좋았다고 잘 설명하고 싶었는데, 나 역시 모리스 보버의 주변인처럼 그저 그라는 사람과 얼마간 시간을 보낸 느낌이라 그의 어떤 부분을, 책의 어떤 지점을 말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었다. 좋은 책에 대해 말하기란 한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되새기며 친구들에게도 이 책은 한 번 꼭 읽어 봐 하고 말해 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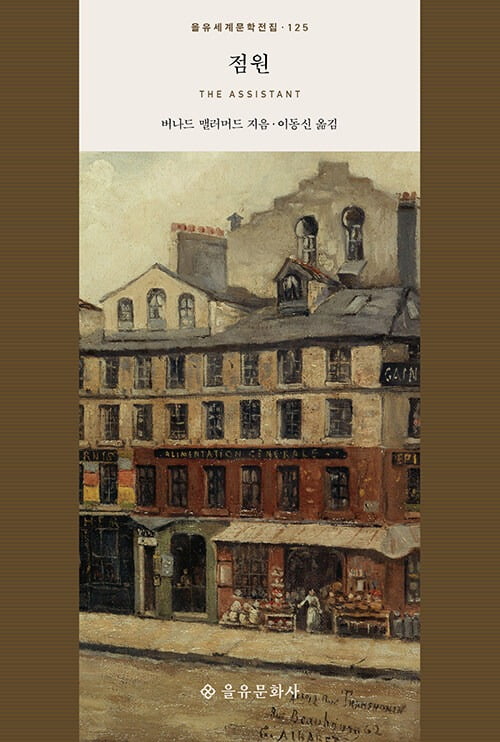


![잘린 머리에 키스 퍼붓는 여자…피 튀기는 광란의 오페라 '살로메' [김수현의 마스터피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021458.3.jpg)

![시장(市)과 우물(井)에서 나는 게 민심이니…[고두현의 문화살롱]](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AA.3500266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