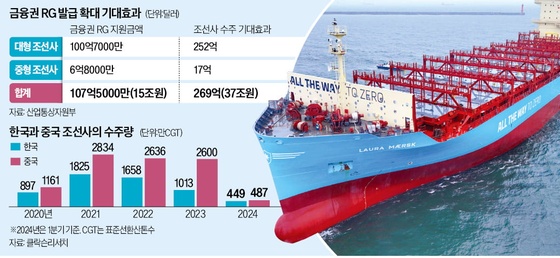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 부동산…대법 "위탁자 재산 아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채권자 신보 "사해행위 해당, 매매 취소해야"
1·2심 신보 승소→대법 '파기환송'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4년 6월 형인 B씨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하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는 2008년 1월 한 신탁회사와 이 아파트에 대한 담보신탁 계약을 맺었다. 신탁 수익자를 A씨로 지정하고 신탁계약이 종료될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한다는 특약사항도 달았다.
이후 B씨는 2016년 8월 이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A씨에게 매도했다. 당시 B씨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B씨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B씨가 A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부족 정도를 커지게 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신용보증기금은 B씨가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만 기각하고, 나머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는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인 B의 재산권에서 분리돼 독립성을 갖게 되므로, B의 책임재산(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B가 아닌 금융기관(우선수익자) 및 A(수익자)로 지정됐으므로, 신탁계약상 수익권 역시 B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닌 타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단독] 7.4兆 '코로나 대출' 부실률 10% 넘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ZA.31678988.3.jpg)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