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인 소행?"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품들, 왜 만들었을까[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라 '화조도', 페루 '나스카 지상화'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술작품
그들은 어떻게, 왜 만들었을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술작품
그들은 어떻게, 왜 만들었을까

전체 그림 크기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인데 맨눈으로는 무늬를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무늬를 제대로 보려면 현미경으로 50배는 확대해야 합니다. 인간을 초월한 솜씨죠. 국가무형문화재 김용운 조각장조차 “현대 기술을 써도 똑같이 그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요. 기사 댓글에서는 “한국이 이래서 반도체 강국이었구나”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 된 건 조상들에게 ‘손재주 유전자’를 물려받은 덕분이라는 우스개지요.
그런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 정도로 정교한 작품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맨눈으로 볼 수 없으니 “참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받지도 못하고, 스스로 만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도 없을 텐데요. 또, 어떻게 만든 걸까요? 오늘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 이런 불가사의한 예술작품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너무 작거나 큰' 예술
화조도를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이 유물이 처음 발견된 건 사실 6년 전(2016년)인데요, 올해가 돼서야 유물 발굴 사실이 발표됐죠. 그 이유도 ‘왜 만들었는지 몰라서’ 입니다. 발굴한 유물을 공개할 때는 어디에 썼고 왜 만들었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설명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물은 몇 년동안 조사·분석해도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일단 그림은 가느다란 철필(끝이 철로 된 일종의 펜)로 눌러 그어서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는 아직 수수께끼인데, 어창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은 “확실한 건 없지만 어떤 물건에 붙어 있던 장식물이거나 신에게 바치기 위해 만든 작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유물은 10월 31일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리는 ‘3㎝에 담긴 금빛 화조도’ 전시를 통해 감상할 수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유물을 직접 보고 용도를 추측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지요.

처음에는 온갖 설이 나왔습니다. “외계인이 UFO를 착륙할 때 참고하기 위해 만든 그림”부터 “당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열기구로 하늘을 날았다”는 주장까지 별별 얘기가 다 돌았죠. 거대한 그림이 하늘에서만 볼 수 있도록 그려져 있으니,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게다가 최소 수천년 전 그림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으니 더욱 신비롭죠.

땅에 그림을 새기는 것도 쉽습니다. 이 지역의 땅은 밝은 색이고 그 위에는 어두운 색의 자갈이 깔려 있는데, 자갈을 치우기만 하면 쉽게 그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천년 전 그림이 남아있는 이유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태풍처럼 그림을 날려버릴 만한 기후 현상이 없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동네입니다만, 이곳의 흙에 많이 들어 있는 석회가 일종의 보존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아침마다 석회가 아침 이슬의 수분을 머금으면서 딱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①이들이 믿었던 ‘하늘에 있는 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렸다는 설이 유력하고요, ②종교 의식을 할 때 신자들이 걷는 길이었다거나 ③일종의 달력 혹은 별자리를 기록한 그림이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계인이 그렸다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외계인의 흔적같은 이 곳, 미술 작품이라고?

도시라는 작품은 미국 네바다주 모하비 사막 한복판에 있습니다. 길이 2.4㎞, 폭 800m 크기의 움푹 팬 땅에 흙·돌·콘크리트로 된 인공 구조물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데요. 여의도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이곳에는 기념비 모양의 삼각형 돌을 비롯해 용도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조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신비롭고 환상적인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황량하고 고요한 사막 한가운데, 외계 문명이 남긴 것 같은 매끈한 돌과 그 그림자 사이를 혼자 거닐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겠죠.

하이저는 대체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다른 현대미술가들처럼 작가는 이 작품을 만든 의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만들었다기에는 작품이 너무 큽니다. 집에 장식할 수도 없는데 이런 걸 누가 사겠습니까. 명성을 얻기 위해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20대부터 미국 현대미술계에서 유명 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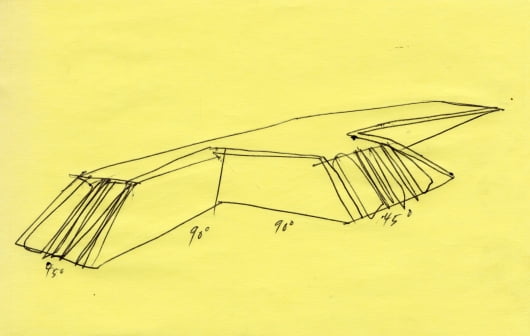
마이클 고반 LA카운티미술관(LACMA) 관장은 “이 작품은 공간을 만들고 조직하려는 우리의 원초적 충동을 인식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멋진 말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설명은 이렇게도 들립니다. “레고나 로봇 조립하는 것 재미있잖아. 대충 그런 거야. 이것도 재미있지 않아?” 하이저는 그걸 아주 오래, 아주 크게 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이게 제일 재미있으니까요.
언젠가 오랜 시간이 흘러 왜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시간이 오고, 그 때 누군가가 이 작품을 다시 발견한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종교 시설이라고 생각할까요, 외계인이 남긴 흔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적어도 ‘현대미술 작품’이라는 것이었다고는 전혀 생각도 못할 겁니다.
화조도나 나스카 지상화도 그저 누군가의 취미였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도 언젠가 먼 훗날엔 이렇게 연구 대상이 될 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희미해진다는 사실은, 가끔은 이렇게 재미있는 생각거리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푸틴의 잔인함은 '열등감' 때문"…러시아 최상류층의 증언 [별 볼일 있는 OTT]](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1.33281562.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