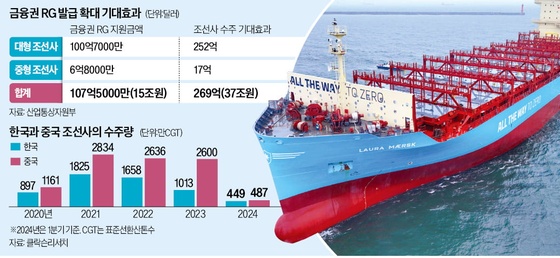머리카락보다 가늘게 새긴 '신라 금박 유물' 공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로 얇게 편 금박에 머리카락 굵기(0.08㎜)의 절반가량(0.05㎜) 선으로 새 두 마리와 꽃들이 조밀하게 새겨져 있어서다. 맨눈으로는 무늬를 제대로 알아볼 수조차 없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식별이 가능하다. 국가무형문화재 조각장 김용운 보유자는 “현대 기술을 써도 재현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혀를 내둘렀다.
문화재청은 2016년 11월 경주의 신라시대 궁궐 터 유적인 동궁과 월지(안압지)에서 발견한 금박 유물을 이날 처음으로 일반에 선보였다. 발견 당시 유물은 둘로 찢어져 각각 팥알 크기로 구겨져 있었다. 어창선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처음 유물을 발견했을 때는 그림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보존 처리를 통해 두 유물이 원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연구와 복원 작업을 거쳐 마침내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금박 유물의 크기는 가로 3.6㎝, 세로 1.17㎝, 두께 0.04㎜에 불과하다. 순도 99.99%의 순금 0.3g이 사용됐다. 금속 가공 기술도 놀랍지만 그림 솜씨는 더욱 놀랍다. 선 두께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0.05㎜. 철필(鐵筆·끝부분이 철로 된 펜)로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국내에서 발견된 유물 중 가장 세밀하다”고 했다.
그림은 새의 종류와 암수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다. 문화재청은 “멧비둘기로 보이며 꼬리 깃털 등을 보면 왼쪽이 암컷, 오른쪽이 수컷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새 주변에는 단화(團華·상상의 꽃) 문양이 빼곡하다. 이송란 덕성여대 교수는 “신라인들이 천상의 세계를 금박에 표현한 듯하다”고 분석했다. 유물은 장식용 혹은 신에게 봉헌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리는 ‘3㎝에 담긴 금빛 화조도’ 전시를 통해 실물을 감상할 수 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외계인 소행?"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품들, 왜 만들었을까[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1012053.3.jpg)
![[고민 카페] 고구려가 더 큰 나라인데 어떻게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죠?](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1.29988613.3.jpg)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