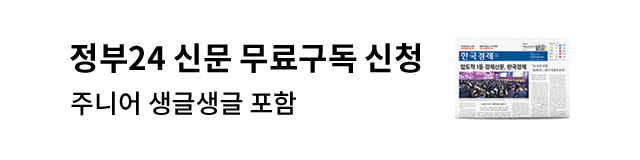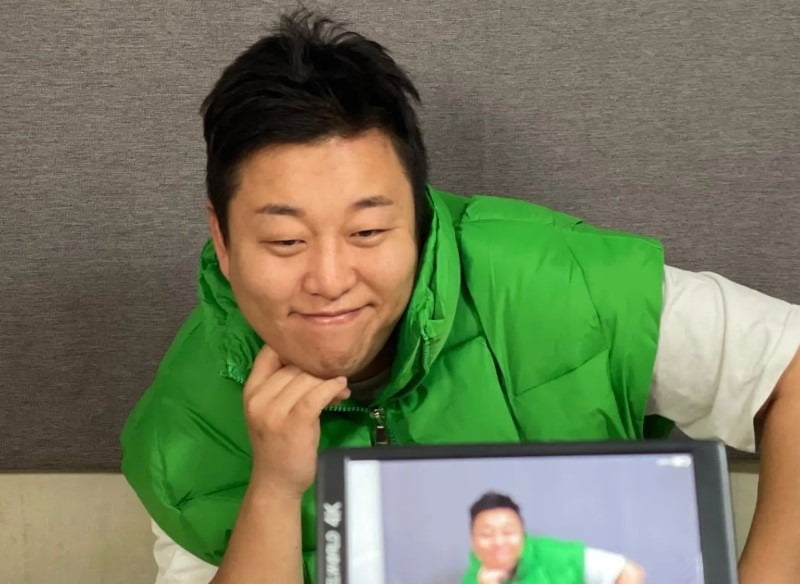조각투자 플랫폼 엇갈린 반응
NFT 합법화 여부에 '촉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뮤직카우가 발행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점에 대해 조건부 제재 유예를 결정했다. 실제 투자자가 17만명이나 될 정도로 서비스가 커진 데가 음악 저작권 산업이 활성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엇갈리는 스타트업 반응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미술품·소 등 조각투자 플랫폼은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아트테크 플랫폼도 증권형 토큰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아지 소유권을 쪼개어 판매하는 뱅카우는 다음 달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유예) 신청을 앞두고 부담을 덜게 됐다. 뱅카우 관계자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참여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인정받으면서 대체자산 조각투자 시장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후행적으로 규제 유예를 허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핀테크업체 대표는 “뮤직카우는 서비스를 먼저 출시한 뒤 뒤늦게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경우”라며 “일단 시장에 내놓고 보자는 식으로 위험한 대체자산 투자플랫폼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선제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인정받은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여전한 투자자 보호 이슈
뮤직카우 서비스 특성상 투자자 보호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
뮤직카우는 개별 음원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경매방식으로 개인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가수의 팬들을 겨냥한 ‘팬덤 굿즈’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영국의 음원 지식재산권(IP) 투자사 힙노시스나 국내 음원 IP 스타트업 비욘드뮤직은 수만 개 음원 IP를 펀드처럼 한데 묶어 수익화하기 때문에 대체자산으로서 안정성을 확보한 편이다.
한 음원 IP 시장 관계자는 “월 10만원이던 신곡 저작권 수입이 6개월 뒤 2000원이 될 수도 있다”며 “음원은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발매 이후 5~8년이 지난 음원 IP가 자산으로서 안정적이다”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