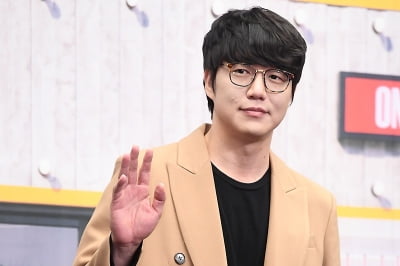지난 5년 공정경쟁 훼손 사례 많아
새 정부, 공정한 룰 만들고 유지해야
윤혜준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경쟁을 뜻하는 영어 ‘competition’의 라틴어 어원 ‘competere’는 ‘다툼’보다는 ‘협동’에 가깝다. 이 단어는 ‘함께(com-)’와 (어떤 대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petere)’가 합쳐진 모습이다.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 같은 목표를 성취하려 서로 겨루는 모습을 띠기에 다툼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겨루기는 ‘함께’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함을 이 라틴어 단어는 상기시킨다. 라틴어에 뿌리를 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에서 경쟁은 각기 ‘concurrence’와 ‘concorrenza’이다. 라틴어 어원대로 풀면 ‘함께 달리다’는 뜻이다. 같은 목표를 향한 달리기 시합을 열기 위해서는 경주 규칙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규칙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애초에 ‘경주’로서 경쟁은 가능치 않을 것이다.
‘경주’로서 ‘경쟁’은 시장 경제사회에서 각자 성과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결정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반면에 ‘협동’과 ‘나눔’은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를 조직화하는 정치적 운동이다. 바로 그렇기에 협동과 나눔에는 다툼의 요소가 내재돼 있다. 협동과 나눔은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로서는 즐겁고 보람 있는 경험이다. 그러나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그 즐거움과 보람이 전파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을 협동과 나눔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낙인찍어 공격할 수 있고, 그러한 공격을 통해 협동 참여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몇 주 뒤면 물러날 현 정권하에서 그러한 예가 적지 않았다. 한 운동권 출신 유명 인사가 ‘녹색드림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사업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2020년 구속된 바 있다. 그가 이끄는 협동조합의 태양광산업이 번창하도록 국가 권력은 원자력산업을 적대 세력으로 지목했다. 그 결과 원자력 관련 사업체들은 국내 및 국제무대에서 경쟁에 나서 볼 기회를 박탈당했다.
경쟁은 각자 ‘먹고 살려고’ 또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서로 경주하는 경제 활동의 본질적 모습이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또 다른 명저인 《도덕 감정론》(1759)에서 바라보는 경쟁의 모습은 달리기 경주다. “부와 명예, 출세를 향한 경주에 있어서 경주자는 모든 신경과 근육이 긴장된 채 온 힘을 다해 경쟁자들보다 앞서기 위해 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누가 경쟁자의 발을 건다든지 상대방을 쓰러뜨린다면, 관객들이 그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스미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스미스가 예로 든 달리기로서 경쟁의 모습은 ‘열심히 뛰기’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온 대한민국에 매우 잘 맞는다. ‘한강의 기적’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한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전후 세대의 경쟁이 이끌어낸 결과다. 모든 경주가 그렇듯이 승자와 패자는 갈렸다. 그러나 경주에서 뒤처진 이들도 주저앉는 법은 없었다. 이들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함께 달리며 이룩한 놀라운 경제 발전의 동력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경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하다. 경주로서 경쟁의 적은 편파 판정이다. 경쟁 참여자들의 반칙을 심판이 선별적으로 용인하거나, 경기의 규칙을 특정 선수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한다면 경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새로 출범할 정부는 아무쪼록 옳지 못한 심판은 교체하고 공정하고 양심적인 심판을 세워 경제 활동 참여자들의 경주가 참가자와 관객 모두 인정할 만한 멋진 시합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주길 기대해 본다.


![[윤혜준의 인문학과 경제] 개혁은 '헌법정신 회복'에서 시작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7.28951932.3.jpg)
![[윤혜준의 인문학과 경제] 마르크스도 탄식할 '주 52시간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7.28951932.3.jpg)
![[윤혜준의 인문학과 경제] 기독교 문명의 선물, 일요일과 주말](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7.2805432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