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억압 속 '은유와 빈칸'으로 5·18 알린 대학신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일 5·18 기념재단 박진우 연구실장이 24개의 대학신문을 분석해 정리한 '대학신문에 나타난 5·18의 보도 형태 연구'에 따르면 당시 대학신문들은 5·18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로 휴교령이 내려진 전국 대학은 5월 항쟁이 무참히 진압된 뒤 110여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지만, 신군부와 대학 당국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 아래 놓였다.
다시 발행되기 시작한 대학 신문도 통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에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학내 시위는 물론 5·18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5·18 1주기를 앞둔 1981년 5월 11일 서울대 '대학신문' 칼럼에서 '5월 18일의 그 날, 광주사태라고 불리어지는 민족의 비극을 잊을 수 없다'는 언급이 유일했다.
다만 전국 대학신문들은 다양한 은유적인 방법으로 5·18을 기억하고 알리고자 했다.
충북대신문은 1981년 5월 25일 자에 만평 자체가 사라졌고, 4칸 만화란에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난해한 그림과 함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박 실장은 "신문지 면에서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흰 공간은 그 자체로 무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며 "항쟁 기간이었던 25일 자에 명복을 빈다는 문구를 넣어 당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대신문은 1981년 5월 7일 5·18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배경에 둔 사진을 게재했다.
그 옆에는 5월의 주요 일정을 알리는 '5월의 메모'가 배치됐는데 5일 어린이날, 6일 성년의 날, 11일 석가탄신일의 일정을 알리며 그다음 일정 한 줄을 빈칸으로 남겨놨다.
직접적으로 5·18을 연상시킬 수 있는 공백을 활용한 것으로 박 실장은 분석했다.
고대신문은 5·18 2주기인 1982년 5월 18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이미지를 1면에 발행해 5·18을 그린 김준태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떠올리게 했다.
박 실장은 "1983년까지 대학신문은 사전 검열을 받는 등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자 은유적인 재현을 시도했다"며 "이런 시도들이 1983년 말 대학 내에서 가시화된 5월 운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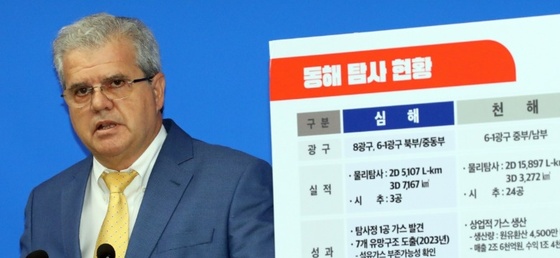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반나절 만에 3,200억 원 손실…시장 흔든 트레이더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8064644263.jpg)








![[고침] 문화([신간] 병자호란과 삼전도 항복의 후유증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6860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