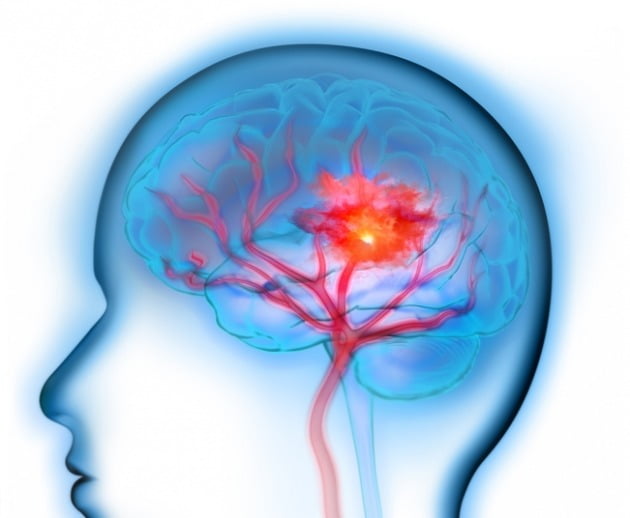그 덕분에 한국 TV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2009년에는 ‘소니 신화’를 앞세운 일본 기업들을 제쳤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TV와 초대형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두 회사가 세계 1~2위를 달린다. 차세대 기술의 초점은 ‘고화질’과 ‘대화면’에 맞춰져 있다.
화질을 좌우하는 요소는 ‘빛’이다. 화면 뒤에서 쏴주는 빛(광원·백라이트)이 필요한 것을 액정표시장치(LCD) TV라고 한다. 광원이 발광다이오드(LED)이면 ‘LED-LCD’다. 최근 눈길을 끄는 것은 ‘미니 LED’ 기술이다. 100~20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크기의 LED를 디스플레이에 촘촘히 배치하기에 화질이 좋다. 지난해부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잇달아 선보인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보다 더 작은 초소형 LED 소자를 적용한 것은 ‘마이크로 LED’라고 부른다. 스스로 빛과 색을 내는 LED 수백만 개를 배열해 하나하나의 화소로 활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광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휘거나 구부리기 쉽다. 무기물 소재를 사용해 수명도 10만 시간이나 된다.
이 기술로 삼성전자가 개발한 상업용 디스플레이가 ‘더 월’이다. 2018년 처음 선보인 뒤 화면이 110인치 이상으로 커지더니, 최근에는 1000인치(대각선 길이 25m)짜리 초대형 제품까지 나왔다. LED 소자 크기를 40% 줄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다. 두께가 절반으로 얇아졌고 S자·L자 형태로 천장에 붙이거나 매달 수도 있다.
삼성의 초대형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가격이 수억원에 이른다. 지난 3월 나온 110인치가 1억7000만원 정도다.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가와 부호들이 앞다퉈 사 간다. 앞으로는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나노 LED를 이용해 퀀텀닷나노발광다이오드(QNED) 제품까지 상용화될 전망이다.
QNED가 성공하려면 나노 LED 소재와 잉크젯 기술도 더 발전해야 한다지만, LED 크기가 작아질수록 화면이 커지는 ‘스크린 혁명’의 신기술 원리가 그저 놀랍기만 하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천자 칼럼] 떡볶이 '내로남불'](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AA.27282105.3.jpg)
![[천자 칼럼] 갈등 공화국](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AA.27263027.3.jpg)
![[천자 칼럼] 히잡, 차도르, 부르카](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AA.2725266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