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마케팅에 대하여
감성 마케팅에 대하여
(딸에게 보내는 경제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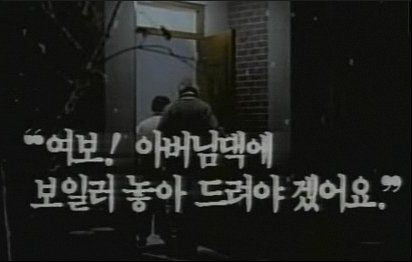
하기사 이쁘지 않은 물건들은 팔리지 않으니까, 핸드폰 회사도 처음부터 그런 요소를 무척이나 감안했겠지. 요즘 나오는 물건들은 정말 예뻐, 으음 진짜 예뻐.
가장 남성적인 제품이라는 자동차도 디자인이 무척 중요시되잖아. 신용카드는 또 얼마나 아름답게 디자인되냐? 화장품은 내용물보다 병이 예뻐서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꽉 잡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지. 아빠의 신발은 맨발로 걷자는 기능성신발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너무 유럽적으로 촌스럽다고 해서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혼났게.
물건 뿐이냐? 한동안 서울을 디자인도시로 만든다고 하면서 이제는 ‘디자인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건물도 이제는 밋밋하게 사각형으로 짓지 않고, 뭔가 멋스럽게 지을려고 하지.
그런데 어째서 마케팅에 있어서 브랜드의 감성이 중요해졌을 까? 얼마 전까지만해도, 물건이란 질기고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쇼핑을 가서 ‘이 옷 얼마나 오래 입을 수있어요?’하며 물어보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 결국은 시장이 변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감성 마케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를 꼽아볼까.
– 제품력만으로는 차별화를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왜냐하면 기술의 평준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화장품을 예로 들어보자. 처음에 아이오페(IOPE)가 시장에 나왔을 때는 무지비싸고 독특한 제품이면서 매우 고급제품이었지만, 이제는 왠만한 화장품 회사에서는 다 만들잖아. 자동차도 그래, 현대자동차가 미국과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지. 그건 그만큼 벤츠나 BMW와 같은 고급차와의 품질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지. 사실 독일 차들도 한국산 부품을 쓰고 있고, 한국차도 독일산 부품을 쓰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품질차이가 많이 날 수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결국 소비자들은 제품 그 자체만으로는 정확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어.
– 기능성 위주에서 상징성 위주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기능이 자신에게 꼭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심리적 만족이 구매의 주된 동기가 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명품을 갖으면 좀 부자같고, 골프를 치면 괜찮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같고, 사진기를 갖고 있으면 예술가같은 느낌들. 그래서 그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이나 품질보다는 디자인이나 이름, 광고를 통해서 얻어진 이미지 등 부수적 요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그래서 기업은 이러한 소비자의 구매취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품 본질 외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내서, 그 회사 제품의 이미지를 높여야 하지.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한 거야.
– 과잉 생산에 빠르게 변하는 유행은 모든 제품을 1회용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제품의 내구성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집에도 말만한 아가씨가 둘이나 있다보니 신발장이 날이 갈 수록 꽉차게 되더구나. 하이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현관 계단에 놓아야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하이힐이 무지하게 싸잖아. 1-2만원이면 한 켤레 사더구나. 그러니 좋아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그리고 몇 번신다가 지겨워지면 그냥 쳐박아 놓고. 하이힐도 이제는 거의 1회용이 되버렸어. 신발이 그 정도인 데 옷은 더하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멀쩡한 옷을 구닥다리같다고 버리지. 색깔과 모양이 워낙에 틀리게 변하다보니, 1-2년지나면 입고 다니기가 어렵게 되었어. 그나마 남자 옷은 2-3년은 입을 수있지만, 유행에 민감한 여자나 청소년층은 1년이상 입고 다니면 벌써 싫증을 내서 입고 다니지를 않아. 또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수입된 옷들이 시장에 가면 값이 무척 싸고, 항상 세일을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할 필요조차 없어. 오히려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합리적인 소비가 끼여들 여지가 없어졌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일단 물건들의 품질이 기본적으로 옛날보다 좋아진 데다, 각 회사마다의 차이가 없어졌지, 그러니 물건을 파는 사람들 즉 마케터들이 소비자들을 설득할 때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함의 느낌으로 파고들 수 밖에 없게 되었어. 그걸 표현하는 수단은 디자인이고, 그럴 듯하게 포장한 말이 감성적 마케팅이야. 감성적 마케팅은 현재 마케팅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광고의 흐름을 잠깐 볼까.
광고를 만들 때에는 무엇을 강조하는 가에 따라서 USP(Unique selling proposition – 제품의 차별화 강조)와 UAP (Unique Advertising proposition – 광고의 차별화 강조) 이 있다. USP는 광고 대상의 특정 브랜드가 경쟁 브랜드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성분이나 기능을 갖고 있을 때 그러한 제품의 차별점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USP는 전략상 상당히 효율적이고 강력한 무기라는 평을 받고 있으나, 이 개념은 제품 자체의 경쟁적 이점이나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제품이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오늘의 광고 시장에서는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다. 아까 IOPE화장품을 예로 들면, 그게 처음 나올 때는 정말 독특한 제품이었거든. 화장품이 예쁘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 데, ‘예쁘게 하면서 얼굴의 주름도 없애준다’잖아. 그 때는 그 기능 하나로 다른 제품들과 완전히 차별이 되었지. 그런데 요즘은 거의 모든 회사에서 IOPE가 나오니, 모델과 병의 모양으로 차별할려고 하지. 그게 광고의 차별화야. UAP! 마켓팅 전문가들이 제품의 진정한 차별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시장 상황은, 이름만 서로 다른 브랜드들만이 존재할 뿐이지 제품 자체의 속성이나 기능에서 비롯된 차별화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한 마디로 하면, 장사해먹기 어려워졌다, 뭐 그런 말이야.
문제는 감성이라는 게 너무 뜨겁고 변덕스러워. 게다가 ‘이성적’이라는 단어와는 달리 ‘감성’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일부분에게만 통용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경제생활은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하지. 그럼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경제 생활에 감성적인 마케팅을 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경제생활에서 ‘감성적’이라는 단어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그럴 듯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댓가로 구매를 하는 교환행위를 하고 하면서, 지출과 수입의 조화라는 합리적 경제행위와는 전혀 별개가 된 셈이지. 특정 제품을 예로 들기 어려우니 드라마를 예로 들자. 드라마의 가장 일반적인 여자 주인공의 유형은 신데렐라야. 하지만 드라마와 같이 백마를 탄 왕자와 결혼할 여자는 전체 수백만 시청자중의 0.1% 도 않되. 대부분은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과 비슷한 신분의 남자와 결혼하잖아. 그런데도 신데렐라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은 ‘환상체험’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 드라마의 광고를 보아야 하는 거야(리모콘이 없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런데 요즘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변했어. 여전히 신데렐라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온갖 무술과 총싸움에 능통한 안젤리나 졸리와 합쳐진 아름다운 여성 전사가 등장하지. 이제 여자들은 다소곳한 신데렐라보다는 직접가서 왕자를 나꿔채는 주인공을 좋아한다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유행이란 쉽게 변하는 데, 그건 광고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가에 따라서 판매자는 소비자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옷으로 따지면 베네통이 노란색을 보여주면 노란 색 옷이 그 해의 유행 색이 되어 작년의 빨간 색 옷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의도적 진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듯 감성적 마케팅은 합리적 소비생활을 저해하고, 주변과 비교하게 함으로써 수입 이상의 지출을 강요한다고 보면 되.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비를 할 때 합리적 소비를 항상 고민해야되. 그런 면에서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비교광고’은 소비자에게 대단히 유익한 광고라고 볼 수있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현대가 감성적 사회라는 것은 결국 허구이고, 일시적인 환상을 제공하는 마케팅의 일환일 뿐이야. 모든 일상 생활의 편리함과 따뜻함마저 금전적 가치로 구매가 가능한 이 세상에서 감성이라는 말은, 가슴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는 감정이라는 단어와도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 것은 감정마저도 이성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차가운 전제가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대면적인 접촉체를 칭하는 공동체마저 사이버로 가는 세상인데, 어떻게 감성적이 될 수 있겠어.
어떻게 보면 감성적 마케팅이란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합의된 상호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날 속여줘, 그럼 나도 속는 체 해주께!’
근데,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조금만 속아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케네디 주니어 “가상자산은 위험에 처한 미국의 유일한 돌파구” [컨센서스 2024]](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02380.3.jpg)



!["심각한 고평가"…AI 서버 수요 의심 커졌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10655477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