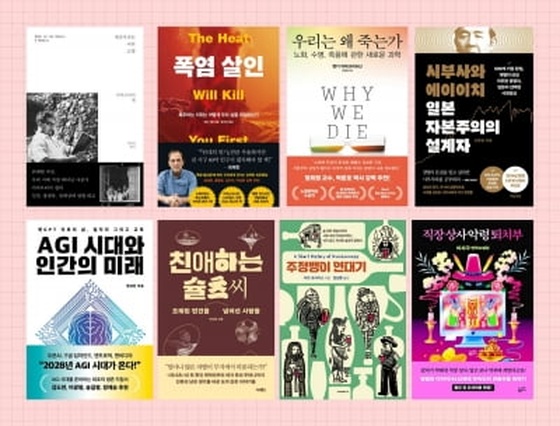[사설] 유럽서 '국민 퇴짜' 맞은 기본소득제, 왜 그랬는지 살펴봐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본소득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으로 서구 좌·우파 모두 관심을 가져온 복지모델이다. 좌파는 빈곤과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파는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기본소득으로 단일화해 사회보장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막대한 세금 부담 탓에 지속가능하지 않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빈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스위스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77%)로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자’는 안건을 부결시킨 게 이런 이유였다. 핀란드는 2018년 4월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던 기본소득 실험을 1년 만에 중단했고, 캐나다 온타리오주(州)는 그해 8월 시범사업 단계에서 접었다.
핀란드 등의 사례는 복지의 지속가능성과 근로 의욕을 자극하는 ‘맞춤·선별형’ 지원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중복된 복지제도를 그대로 놔둔 채 표를 얻기 위한 ‘현금 퍼주기’ 경쟁을 일삼는 한국의 상황은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보강하지도 못하고 재정만 거덜낼 뿐이다. 정치권 일각의 주장대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상응하는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나눠주려면 연 436조원(올해 예산의 85%)이 든다는 자유기업원 분석도 있다. 국가를 걱정하는 선량이라면 이런 포퓰리즘 공약을 접는 게 도리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