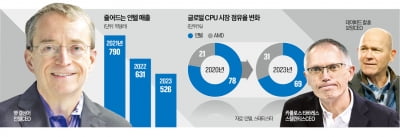‘싱가포르의 국부(國父)’ 리콴유는 “이른 아침과 해 질 무렵에만 일할 수 있던 싱가포르인에게 에어컨은 인류 최고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그가 1965년 취임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건물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낮잠과 게으름을 줄이고 열대우림의 전염병까지 막을 수 있었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다. 에어컨은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고온다습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였다. 도시 형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미국 남부와 서부의 휴스턴 댈러스 뉴올리언스 피닉스 라스베이거스 같은 도시가 발전하고, 두바이 홍콩 선전 방콕 리우데자네이루 등이 거듭났다.
에어컨은 1902년 미국 기술자 윌리스 캐리어가 발명했다. 폭염 속에서 인쇄기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다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열을 흡수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후 냉장고와 함께 20세기 최고 발명품으로 주목받은 에어컨은 1950년대 소형화에 성공하면서 미국 가정에 널리 퍼졌다.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60년대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에도 없던 에어컨을 석굴암 결로(이슬 맺힘) 방지용으로 써서 화제를 모았다. 1960년대 말에는 센츄리와 금성사(현 LG전자) 에어컨이 등장했다. 1970년대 TV 크기의 창문형 에어컨에 이어 1980년대에는 벽걸이 에어컨, 1990년대엔 스탠드형 에어컨이 나왔다.
최근에는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에어컨까지 개발됐다. 얇은 온도조절용 단말기를 셔츠에 내장해 피부 표면 온도를 23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두께 2㎝, 무게 85g에 스마트폰 전용 앱(응용프로그램)으로 5단계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양복 속에 입어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다. ‘입는 에어컨’이 상용화되면 사무실 도서관 지하철에서 서로 “춥다” “덥다”며 상반된 요구를 하는 ‘에어컨 온도 전쟁’도 줄어들 수 있겠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천자 칼럼] '자랑스런 동문'과 '부끄러운 동문'](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A.20269382.3.jpg)
![[천자 칼럼] 조선의 도공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A.20262194.3.jpg)
![[천자 칼럼]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A.2025562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