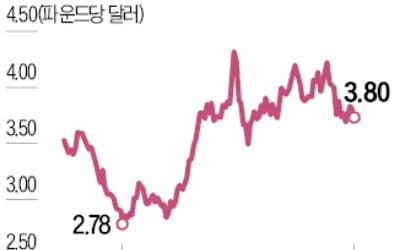뒷말 걱정 아닌 성과를 얘기할 때
유창재 마켓인사이트부 차장

반면 오늘의 커피는 계산대 뒤에 미리 커피를 내려놓은 통이 있어 주문받는 사람이 바로 따라준다. 주문 후 30초면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에스프레소의 진한 풍미보다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이 오늘의 커피를 선택한다.
서울에 돌아온 이후로는 스타벅스에서 오늘의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드립커피를 미리 내려놓는 매장이 거의 없는 탓도 있지만 황당한 경험을 한 뒤엔 아예 주문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분명히 내려놓은 오늘의 커피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바로 따라주지 않고 순번이 한참 뒤인 번호표를 건네는 게 아닌가. “커피가 있는데 왜 기다리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다른 음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불평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묻지마 형평’을 위한 비효율의 극치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최우선인 사회가 됐다. 효율적인 방법이 눈에 보여도 불만이 나오지 않을 비효율을 선택한다.
국내 연기금들이 위탁운용사를 뽑을 때 활용하는 공개 선발 절차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업계에서는 자조적 시각을 담아 ‘뷰티 콘테스트(미인 선발대회)’라고 부른다. 소위 전문가로 불리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위탁 운용사를 선발한다. 국민연금 같은 대형 연기금의 위탁 운용사가 되면 꽤 큰돈을 벌 수 있다. 탈락하는 운용사는 그만큼 배가 아프다. 투서가 난무하는 일도 적지 않다.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해외 연기금들은 평소 외부 운용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다가 수시로 출자를 결정한다. 한국에선 평소 운용사를 만나 본 적도 없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만 보고 위탁 운용사를 선정한다. 어느 쪽이 성과가 좋을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벌써 수년째 지적돼온 문제지만 바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뒷말이 나올 걸 두려워해서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구조조정 회사를 매각할 때 반드시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특혜 매각’이라는 뒷말이 나오면 될 일도 안되기 때문이다. 경쟁 입찰을 꺼리는 기업들은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는다. 산업은행 관리 아래 주인을 찾지 못한 기업들이 십수 년째 부실화되고 있는 배경이다.
너무 길어 이름을 외우기도 힘든 온갖 정부위원회가 난립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저임금도, 에너지 정책도, 교육 정책도 비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가 결정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지만, 실은 ‘뒷말 방지용’이다.
멀쩡히 운영되던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하자는 교육감들은 또 어떤가. 일부만 좋은 교육을 받는 것보다 다같이 덜 좋은 교육을 받는 게 낫다는 사회다. 그래야 배 아픈 사람도 없고 뒷말도 나오지 않으니까.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말 나오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회의 결말은 끔찍하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서로를 끌어내리는 사회다. 압축성장기 배 아픈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을까. 역사가 ‘정반합’의 순서로 발전한다지만 지금의 ‘반’은 과도하다. 이제는 ‘합’을 얘기할 때가 됐다.
yoocool@hankyung.com


![[편집국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따라하는 美 정부](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07.17972872.3.jpg)
![[편집국에서] '半샷법'된 기업활력제고법, 이대로 둘 건가](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07.14286610.3.jpg)
![[편집국에서] 안하무인 노조권력, 국민 외면 자초하는가](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07.1521433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