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키신저 같은 안보전략가가 필요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교 전문가들의 조언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 고위관료의 고언이다.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은 1970년대 냉전기에 미국 외교의 지평을 중국, 베트남, 중동 등으로 넓힌 인물이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의 약점은 전문가층이 두텁지 못하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키’를 쥐고 외교부 관료들을 지휘하는 형태인데, 정작 청와대에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보 전략을 가진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만 해도 통상 분야 전문가다. 취임 당시에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북핵, 과거사 등의 현안을 다루기엔 현장 경험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평가가 많다.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강 장관 임명은 청와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외교전략을 짜기 위한 인사라는 말이 현 정부 인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토대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 외교 전문가는 “외교가 이처럼 펀더멘털리즘(근본주의)에 휩쓸리는 것은 대통령의 신념이나 판단에 의존해서 외교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토대인 탈냉전적 사고로는 대응하기 힘든 ‘힘의 충돌’이 동북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북아 외교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도 우리로서는 방관하기 어려운 일이다. 아베 총리는 기업인 500여 명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에서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이 핵심 일원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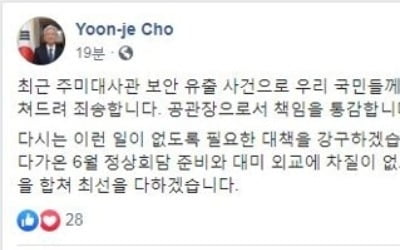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