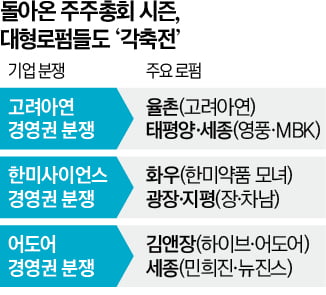검찰 수사 '과속' 논란에 "물불 가릴 처지 아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 초강수에 등 터지는 기업
버티는 대통령, 눈 앞엔 특검
버티는 대통령, 눈 앞엔 특검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특검 출범을 10일가량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과속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도 나름의 고민이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 특검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면 수사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 불가’를 선언하며 버티고 있고, 뒤에는 특검이 쫓아오는 형국이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특검 임명 때까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번 주말과 다음주 중반께가 수사의 절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이 특검에서 가장 듣기 싫은 평가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말일 것”이라며 “검찰이 최근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자 검찰 안팎에선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다음달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김 총장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흘러나온다. 김 총장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특수부와 형사부 연합팀을 꾸려 수사를 지휘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현 검찰을 불신임하는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최순실 사건 이전만 해도 ‘벼랑 끝에 선’ 신세였다. 사상 최대 인력을 동원한 롯데 수사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검찰의 무능이 드러났다. 스폰서 검사 비리까지 겹쳐 권위와 신뢰에 치명타를 입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에 쫓긴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고삐 풀린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 특검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면 수사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 불가’를 선언하며 버티고 있고, 뒤에는 특검이 쫓아오는 형국이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특검 임명 때까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번 주말과 다음주 중반께가 수사의 절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이 특검에서 가장 듣기 싫은 평가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말일 것”이라며 “검찰이 최근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자 검찰 안팎에선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다음달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김 총장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흘러나온다. 김 총장은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특수부와 형사부 연합팀을 꾸려 수사를 지휘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현 검찰을 불신임하는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최순실 사건 이전만 해도 ‘벼랑 끝에 선’ 신세였다. 사상 최대 인력을 동원한 롯데 수사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검찰의 무능이 드러났다. 스폰서 검사 비리까지 겹쳐 권위와 신뢰에 치명타를 입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에 쫓긴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고삐 풀린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