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 직원들은 납작 엎드려 있다. 숫제 ‘날 잡아 잡수쇼’ 하는 투다. 그 어떤 손가락질과 비난도 감내하겠다는 자포자기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렇다고 이들이 할 말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불만은 하나로 모아진다. ‘왜 우리만 갖고 그래?’다.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따지고 보면 맞다. 뭐 하나 산은 뜻대로 된 것이 없다. 최고경영자(CEO)부터 그렇다. 1954년 창립 때부터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나 정권 실세들이 CEO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
홍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 출신으로, 과거 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였다. 일찌감치 실세로 소문난 사람이다. 산은 회장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AIIB 부총재로 옮겨 갔지만, 정부 관계자 누구도 그 배경을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전임자인 강만수 전 회장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지낸 실세 중 실세였다. 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아니되옵니다’라고 진언할 수 있는 간 큰 직원은 드물었다.
면면이 거물들인 만큼 창립 이후 호칭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같은 ‘총재(governor)’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질타로 민유성 행장 때 잠시 ‘행장’으로 격하됐지만, 이 정부 들어 다시 ‘회장’으로 격상됐다.
이런 회장들도 대우조선 등 관리회사들의 CEO를 자기 뜻대로 하지 못했다. 정권 실세를 등에 업었다는 사람들이 CEO 자리에 앉았다. 연임도 자기들 맘대로 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도 그랬다. 노무현 정부 때 선임된 남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연임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실세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으며,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승자의 과욕’ 이젠 버려야
그러다보니 1대 주주인 산은이 안중에 있을 리 만무했다. 남 전 사장은 산은이 파견한 감사실장을 이사회 의결 없이 사실상 해고하고, 감사실을 없애 버리기도 했다. 대신 외부 인사를 줄줄이 고문이나 상담역으로 영입해 ‘성의’를 표시했다. 산은으로선 통제 불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산은이 잘했다는 게 아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대우조선 부실 책임을 면할 순 없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다. 이를 위해선 청와대와 정권 실세라는 사람들이 ‘승자의 과욕’을 버려야 한다. 국책은행인 만큼 회장을 내려보내는 건 좋다. 다만 할 만한 사람을 보내라는 거다. 그저 정권의 전리품인 양 나눠먹기식으로 산은 회장을 선임한다면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제2의 홍기택’은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
대우조선 등 관리회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앞뒤 안 가리고 자리만 탐한 다음, 나중에 불거진 부실 경영 책임을 온통 산은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비겁한 짓이다. 비겁한 짓이 어디 이뿐이겠냐만은.
하영춘 편집국 부국장 hayou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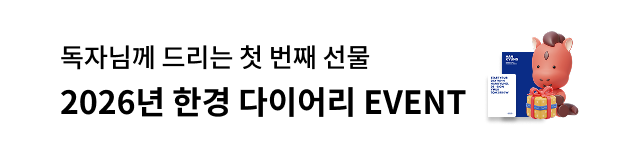
![[기고] 고려아연의 美 제련소 투자, 국가경쟁력에도 기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1.42723474.3.jpg)
![[한경에세이] 도봉의 무게](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42301768.3.jpg)
![[다산칼럼] K산업 미래, 원전생태계 복원에 달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3742064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