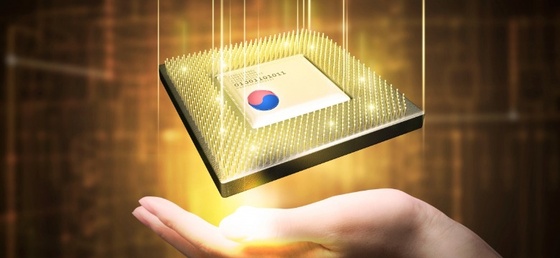[정규재 칼럼] 민주주의 낙관하던 시대 끝났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백인·북유럽 밖에선 확장력 잃어
'진보 낙관주의' 시대는 끝났다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
민주주의는 독립 자존하는 개인들의 자기성찰을 전제로 하는 그런 정치 제도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사정도 좋지 않다. 한국 민주주의는 갈수록 개인 아닌 집단 즉, 인민주의에 경도되고 있다.
대중추수적 정치로 전락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자유는 점차 반(反)자유의 정치 구호들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경제민주화는 최근의 구호들 중에서 가장 반자유주의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그런 구호로 선거를 치렀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춤을 췄다. 1987년 6월 시민혁명을 거친 아시아 유일의 국가가 한국이다. 그러나 민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한국인의 의식 깊숙이 숨어 있던 전근대성이 근대적 정치언어들로 포장돼 부상한 것이다. 최근의 정계 형편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안철수 호남당과 문재인 386당이 대표적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한꺼풀만 벗겨내면 지역성과 좌경이념으로 간단하게 인수분해된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지역주의는 역사를 떠밀려 온 봉건 잔해들이다.
인도는 선거 민주주의를 경영하는 가장 덩치 큰 나라다. 그러나 포퓰리즘을 벗어나기 어렵다. 인도에는 지금도 계급이 살아있다. 사회혁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깊이랄 것이 없다. 계급제도를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는 사회의 외곽을 겉돈다. 중국은 아예 공산당 독재다. 최근에는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며 체면마저 벗어던지고 말았다. 다양한 민족, 거대한 국토, 15억명의 인구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중국 지식층의 호언장담을 들어야 하는 것은 실로 곤혹스럽다.
아랍은 ‘아랍의 봄’ 5년 만에 심각한 정치적 혼란에 밀려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급기야 수니파와 시아파로 대립하면서 한판 승부를 벌여볼 태세다.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가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이처럼 멀다. 평화가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듯이, 민주주의도 독재의 부재만은 아니다. 독재가 사라진 곳에 전근대성 즉, 낡은 것이 고개를 든다. 시리아도 그럴 것이다. 미래를 낙관할 근거는 없다. 남미 벨트는 선거라는 점에서는 형식상 민주국가지만 실은 페론이즘의 지배체제다.
미국에서조차 민주주의 타락이 완연하다. 품위와 자부심, 절제와 공존은 지나간 시절의 기억이다. 트럼프의 허풍과 샌더스의 몽상을 들으면서 미국을 다시 보게 된다. 이런 수준의 나라였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쇼비즈니스화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아내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거나 둘째 아들 부시를 또 봐야 하는 것은 실로 낯선 일이다. 비유럽적 기원으로부터의 이민의 급증이 정치적 구심점을 훼손한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관찰된다. 통일 한국도 동일한 기원이지만 전혀 이질적인 새 식구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새 식구는 민주주의 지수 세계 꼴찌(167위)인 북한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순교했던 자들이 한국에는 많았다. 슬프게도 희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개중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은 사람도 많다. 추한 얼굴만 남아 한때의 로맨스를 말하는 늙은 창녀 같은 얼굴을 하고 이들은 지금도 정치판을 기웃거린다. 낙관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정규재 주필 jk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선제적 아닌 '눈치보기' 통화정책…Fed는 왜 필요한가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192630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