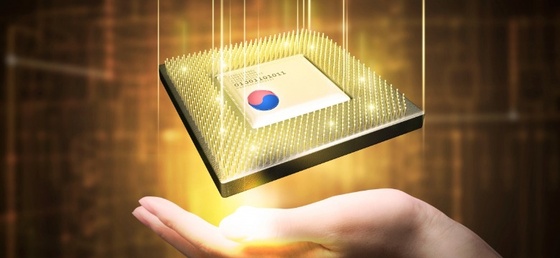[천자칼럼] 헌책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천자칼럼] 헌책방](https://img.hankyung.com/photo/201512/AA.11054668.1.jpg)
세계 최초 책마을인 영국의 헤이온 와이도 낡은 책방에서 출발했다. 50여년 전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이 마을 출신 청년이 헌 창고를 책방으로 개조한 것이 지금은 40여개로 늘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50만명이나 된다. 미국 LA의 더 라스트 북스토어에서도 오래된 책의 풍미를 맛볼 수 있다. 2층에는 앤티크 소품을 파는 가게도 있다. 낡은 레코드음반 판매점 등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물건이 많다.
최근에는 새로 생긴 중고서점들의 인기도 치솟고 있다. 2012년 조지아주에서 시작해 8곳으로 지점을 늘린 월스 오브 북스는 워싱턴DC까지 진출했다. 이 집 주인은 “박물관이나 극장 같은 문화공간이자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헌책방이야말로 좋은 투자처”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에서 헌책방이 성업 중인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다. 헌책방은 인근 주민들이 책을 사고팔며 함께 모여 읽는 지역친화적 문화공간인 데다 뜻하지 않는 책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외지인들까지 불러들인다.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집을 줄여 이사하면서 내놓는 헌책을 젊은이들이 산다. 수익성도 좋다. 원가의 10%에 사서 50% 안팎에 파니까 이문이 쏠쏠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고책방이 가파른 성장세다. 온라인 서점 중고책 사업의 ‘원조’ 격인 알라딘은 해외까지 합쳐 20군데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파크 도서의 중고책 구입 전용 차량 ‘북버스’와 예스24의 ‘바이백’ 서비스, 교보문고의 ‘스마트 가격비교’ 프로그램도 인기다. SK플래닛 11번가의 중고 도서 매출은 지난해보다 6.8배나 뛰었다. 헌책을 소독기에 넣고 자외선으로 살균한 뒤 포장해 전달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지난해 국내 중고책 판매시장 규모는 2470억원으로 2010년(118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커졌다. 올해는 2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책방을 찾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느리게 둘러보는 재미’를 얘기한다. 낡은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거닐다 우연히 맘에 드는 옛날 책을 발견했을 때의 즐거움이야말로 새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묘미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선제적 아닌 '눈치보기' 통화정책…Fed는 왜 필요한가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192630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