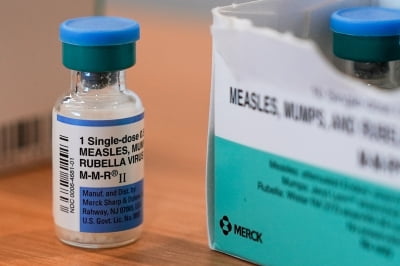[사설] 사법시험 존치론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7년 폐지될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사시(司試) 존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엊그제 국회에선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시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토론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동안 사시가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며 사시와 로스쿨 제도의 절충을 언급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로스쿨이 법조인 선발을 독점하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특권층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시 존치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들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사시 존치 주장에 앞서 왜 여야가 사시 폐지에 합의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시 제도가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을 낳고, ‘사시 낭인’ 등 국가적 인력 낭비를 초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시 합격증은 우리 사회의 평생 특권 신분증으로 통한다. 국회가 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의 전관예우를 문제 삼으면서 정작 사시로 굳어진 법조계의 기득권은 못 본 척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사시 존치론의 논거는 한마디로 로스쿨의 비싼 학비가 신분상승을 막는다는 것이다. 변호사 공급이 늘어난 데 따른 법조계의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36%이고, 저소득층에는 국가 전액 장학금도 있다. 사시만이 ‘희망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부의 대물림’이란 이분법은 왜곡에 가깝다. 사시 준비생들이 기약도 없이 각자 부담하는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다.
사시를 로스쿨로 전환하는 것은 법조인의 ‘특권 신분증’을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이 공급될수록 법률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다시 되돌려 특권 신분증을 살리자는 주장은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사시 존치 주장에 앞서 왜 여야가 사시 폐지에 합의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시 제도가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을 낳고, ‘사시 낭인’ 등 국가적 인력 낭비를 초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시 합격증은 우리 사회의 평생 특권 신분증으로 통한다. 국회가 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의 전관예우를 문제 삼으면서 정작 사시로 굳어진 법조계의 기득권은 못 본 척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사시 존치론의 논거는 한마디로 로스쿨의 비싼 학비가 신분상승을 막는다는 것이다. 변호사 공급이 늘어난 데 따른 법조계의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36%이고, 저소득층에는 국가 전액 장학금도 있다. 사시만이 ‘희망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부의 대물림’이란 이분법은 왜곡에 가깝다. 사시 준비생들이 기약도 없이 각자 부담하는 비용도 결코 만만치 않다.
사시를 로스쿨로 전환하는 것은 법조인의 ‘특권 신분증’을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이 공급될수록 법률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다시 되돌려 특권 신분증을 살리자는 주장은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