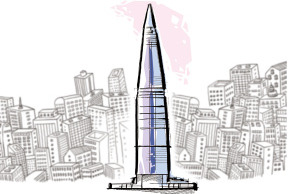
에펠탑 방문객은 연간 700만명. 2억5000만명이 다녀갔다는 집계가 나온 게 벌써 2년 전이다.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 파리를 먹여살리는 기본 인프라가 이 거대한 철탑과 개선문, 루브르박물관 정도일 것이다. 에펠탑의 경제학이랄까.
랜드마크라는 게 건설 과정에선 논란거리일 때도 많다. 킹콩을 비롯해 70여편 영화의 무대도 되면서 세계의 뉴욕으로 끌어올린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도 그랬다. 이 초고층 빌딩도 건설 때는 많은 인부가 희생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멋지게 완성해 잘 가꾸면 명물이 된다. 드라마로 뜨고 유명인들도 방문하면서 스토리가 하나하나 입혀지면 글로벌 명소가 된다.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없는 뉴욕이라면 뭔가 아쉬워질 것 같지 않은가. 70년 이상 뉴욕의 랜드마크로 군림해오면서 지금도 세계인을 이 도시로 유혹한다.
서울의 으뜸 랜드마크는 무엇일까. 남산타워? 숭례문? 한때는 63빌딩도 그런 축이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세대를 뛰어넘는 서울의 상징물이라기엔 아쉬움이 있다. 시각적으로 우뚝함, 접근성, 흥미진진한 스토리의 3박자가 두루 갖춰져야 한다. 2년 뒤 잠실의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555m의 123층짜리 이 건물이 일단 시선은 붙잡을 것 같다.
정작 서울시가 추진했던 랜드마크 빌딩은 따로 있었다. 서울시가 미디어·IT 지구로 개발해온 상암동의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640m 133층짜리 프로젝트였다. 25개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서울라이트타워컨소시엄의 3조7000억원짜리 마천루 건설은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좌초했다. 이 사업을 서울시가 재추진한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자본의 관심이다.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벌써 투자의사를 밝혔다. ‘마천루의 저주’라는 일종의 빌딩경제학 이론도 있지만, 사업 기획만 잘 하면 해볼 만할 것이다. 그렇게 도시는 또 한 번 진화하게 되고, 무수한 볼거리 재밋거리 추억거리도 만들어진다. 멋진 서울의 상징으로 ‘랜드마크의 경제학’을 새로 쓸 수 있는 사업가들의 활약이 기다려진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월요전망대] 이창용 물가안정 점검 간담회…내년 금리 인하 속도내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20565573.3.jpg)
![[다산칼럼] 올해의 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2276634.3.jpg)
![[데스크 칼럼] 정쟁에 휘말린 마약과의 전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280102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