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좋은 대학이란
총장으로서 항상 고민하는 난제
강성모< KAIST 총장 president@kaist.ac.kr >
![[한경에세이] 좋은 대학이란](https://img.hankyung.com/photo/201409/AA.9117433.1.jpg)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이지만 특이하게도 대학이 운영하는 연구소, 캘리포니아 공대의 자부심, 1년 예산이 KAIST의 세 배나 되는 이 거대한 조직은 딱 세 가지로 출발했다. 역량 있는 학생, 그 가능성을 알아본 교수의 지도, 그리고 그들의 연구를 지원해준 캘리포니아 공대의 결단이었다. ‘즐거운 연구를 통한 과학적 성취.’ 총장인 내가 늘 추구하고 싶어하는 대학 성장의 방향이다.
KAIST는 2014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공학기술 17위, 종합 51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학계 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졸업생 평판도, 국제화 수준 등 정해진 항목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고 대중은 그 숫자로 학교를 평가한다. ‘높은 순위=좋은 학교’가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지만, 그 숫자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힘을 얻는다. 세간의 지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총장인 나의 현실이다.
현실과 이상의 틈새에서 항상 고민한다. 평가에 끌려다니면 창의적인 인재를 잃게 될 것이다. 교육기관 본연의 정체성도 위협받을 것이다. 반대로 틀에 박히지 않은 모든 연구에 날개를 달아주자니 ‘숫자’가 발목을 잡는다. ‘국비만 받고 제 몫은 못한다’는 비난이 쇄도할 것이며 ‘실적’ 바탕으로 책정되는 연구비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 연구비가 줄면 엉뚱한 가능성을 믿고 지원해줄 여유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것이 오로지 나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정량화된 대학 평가를 거부하고 나선 학생들의 움직임을 보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대학 행정가로서 짊어져야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극렬하게 대면한 기분이다. 참으로 커다란 과제요, 모호한 난제다. 자유로운 학문 탐구를 허하면서도 합리적인 평가 지표를 정립하는 방안은 정말 없는 것일까?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나는 오늘도 해답을 찾고 있다.
강성모< KAIST 총장 president@kaist.ac.kr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행복하기 그리고 잊지 않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29524.3.jpg)
![[특파원 칼럼] 100년 후 연금까지 고민하는 일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64071.3.jpg)
![[홍영식 칼럼] 헌법 전문은 '장바구니'가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70378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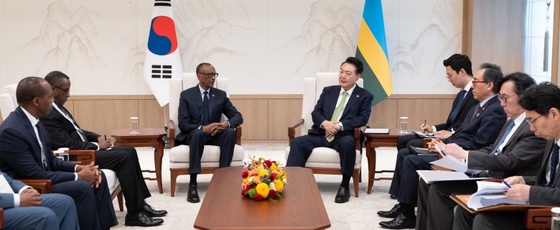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