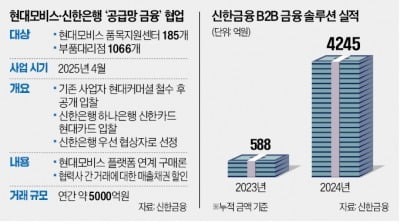[왜 기업가정신인가] 스타트업에 인재 몰리는 이유?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실리콘밸리엔 인력난이 없다
페이스북이 최근 20조원을 투자해 모바일 메신저 와츠앱을 인수하면서 와츠앱 창업자는 돈방석에 앉았다. 임직원들에게도 30억달러(약 3조2000억원)가 스톡옵션 형태로 돌아간다. 와츠앱 직원은 고작 50명. 한 명당 평균 600억원가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엔 이런 꿈을 꾸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에서 이뤄진 인수합병(M&A)만 700건이 넘었다. 구글은 올 들어 네스트를 32억달러에 인수했고 애플은 테슬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아 인수되거나 기업공개(IPO)를 하면 창업자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대박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지난해 트위터를 포함해 실리콘밸리에서만 미국 전체의 15% 정도인 20건의 IPO가 이뤄졌다.
열린 기회와 높은 확률에 최고 인재들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몰리고 있다.
스콧 디첸 퓨어스토리지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엔지니어 한 명을 뽑는데 200명의 이력서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우수한 인력들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며 “어떤 직종이든 상위 2% 내에 드는 인재를 뽑으려 한다”고 했다. 플래시 스토리지 회사인 퓨어스토리지는 창업한 지 5년이 채 안 됐지만 임직원이 400여명에 달한다. 우버는 최근 구글에서 일하던 브렌트 칼리니코스를 최고재무책임자(CFO), 그루폰에서 부사장을 지낸 제프 홀든을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영입했다.
월가 은행원이던 박찬웅 우버 한국지사장은 “스타트업에 인재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 입사 후 한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고 주말에도 일한다. 실리콘밸리 대부분의 스타트업엔 근무시간이나 휴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박 지사장은 “지원 기준은 현재 그 회사의 규모나 처우가 아니라 설립자의 창업 철학과 성장 가능성”이라며 “무엇보다 회사의 성장이 곧 자신의 성장이라는 일체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에서 이뤄진 인수합병(M&A)만 700건이 넘었다. 구글은 올 들어 네스트를 32억달러에 인수했고 애플은 테슬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아 인수되거나 기업공개(IPO)를 하면 창업자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대박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지난해 트위터를 포함해 실리콘밸리에서만 미국 전체의 15% 정도인 20건의 IPO가 이뤄졌다.
열린 기회와 높은 확률에 최고 인재들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몰리고 있다.
스콧 디첸 퓨어스토리지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엔지니어 한 명을 뽑는데 200명의 이력서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우수한 인력들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며 “어떤 직종이든 상위 2% 내에 드는 인재를 뽑으려 한다”고 했다. 플래시 스토리지 회사인 퓨어스토리지는 창업한 지 5년이 채 안 됐지만 임직원이 400여명에 달한다. 우버는 최근 구글에서 일하던 브렌트 칼리니코스를 최고재무책임자(CFO), 그루폰에서 부사장을 지낸 제프 홀든을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영입했다.
월가 은행원이던 박찬웅 우버 한국지사장은 “스타트업에 인재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 입사 후 한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고 주말에도 일한다. 실리콘밸리 대부분의 스타트업엔 근무시간이나 휴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박 지사장은 “지원 기준은 현재 그 회사의 규모나 처우가 아니라 설립자의 창업 철학과 성장 가능성”이라며 “무엇보다 회사의 성장이 곧 자신의 성장이라는 일체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