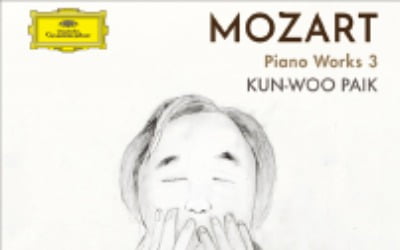화필 잡은 광부의 삶에 기립박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극 리뷰 - '광부화가들'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중인 연극 ‘광부화가들’의 즐거움과 불편함은 이런 상반된 감정에서 비롯된다. 극은 1930~1940년대 영국 북부 탄광촌 애싱턴에서 활동한 광부 화가 공동체 모임인 ‘애싱턴 그룹’의 실화를 다룬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로 유명해진 영국 작가 리 홀의 작품이다.
1막은 ‘박장대소’의 연속이다. 조지 해리 올리버 지미 등 개성과 주관이 뚜렷한 광부들이 미술 강좌 선생 로버트와 함께 그림을 배우고, 직접 그리고, 그들이 그린 그림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웃음을 유발한다. 고단한 삶을 사는 그들이 창작활동을 통해 예술을 이해하고 화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2막에서는 예술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본격적으로 던진다. 로버트는 제도권 예술계에 ‘광부화가들’을 소개하며 “누구나 다 예술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룹을 대표하는 올리버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광부화가들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한 고민이 표출되고, 예술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논쟁도 벌어진다. 이렇듯 ‘주장들’이 펼쳐지며 약간 지루해진다. 캐릭터들의 충돌에서 유발되는 웃음의 강도도 약해지고 드라마의 연결성도 헐거워진다.
결말 부분은 영화 용어를 빌리자면 ‘점프 컷’(급격한 장면 전환) 느낌이다. 종전 후 다시 작업실에 모인 광부화가들. 올리버가 직접 그린 대형 걸개 그림을 펼치고, 함께 “우리에게 예술을! 사람을 위한 예술! 모두 함께 누리는 예술”을 반복해서 외친다.‘예술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던 올리버가 선동적으로 변한 모습이 갑작스럽고 낯설다.
작가는 광부화가들을 통해 “예술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어한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광부화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강신일 김승욱 민복기 송재룡 김중기 등 베테랑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와 빈틈없는 호흡, 유기적인 움직임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화음을 듣는 것처럼 황홀하다. 무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이상우 연출가)의 노련한 손길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공연이 끝난 후 살짝 불편하고 헛헛한 느낌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연은 내달 13일까지, 2만~5만원.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