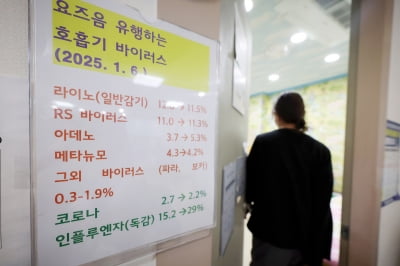기자 생활 60년 중 50년을 백악관에서 보낸 그는 브리핑룸 맨 앞줄에 앉아 공격적인 질문을 퍼붓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면서도 ‘백악관의 고정자산’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57년간 근무했던 UPI통신이 경영난으로 합병되자 사표를 던지고 칼럼니스트로 변신한 80세 이후에도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고정석에 앉았다. 기자회견은 늘 그의 첫 질문과 마지막 인사로 진행됐다.
이런 경륜 덕분에 그의 대통령 평가는 위력을 발휘했다. 그는 케네디를 ‘미국인이 더 높은 곳을 보도록 만든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호평했으나 닉슨은 ‘두 갈래 길에서 항상 잘못된 길을 택하는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이라크전을 선포한 조지 W 부시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스캔들의 대명사 클린턴은 ‘대통령이란 신화에 흠집을 낸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레바논 이민 2세인 그는 전쟁과 이스라엘을 무척 싫어했다. 2010년 백악관 뜰의 유대인 행사에서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에서 떠나라”고 말한 게 문제가 돼 결국 90세에 기자직을 그만뒀다. 가난한 야채상의 딸로 태어나 고학으로 대학을 마친 뒤 최고의 명성까지 얻었지만, 그의 사생활은 건조한 편이었다. 51세 때 라이벌 언론사 AP통신의 백악관 출입기자 더글러스 코넬과 결혼했는데 62세 때 사별하고 말았다.
지난 주말 93세로 별세한 그가 백악관 최장수 출입기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최장수는 따로 있다. 2003년 세상을 뜬 여기자 새라 매클렌든이 56년간 출입했으니 6년 뒤진다. 하지만 90세까지 현역으로 뛴 최고령자이자 회견 첫 질문자로 늘 예우받은 것은 토머스가 유일하다.
생전에 “미래의 미국 대통령들에게 할 말을 딱 한 문장으로 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정도를 가라. 달리 갈 곳이 없다”고 했던 그의 충고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나 적용되는 경구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도를 가는 게 국가지도자의 최고 리더십이다. 역사학자 헨리 애덤스가 “훌륭한 대통령은 선장과 같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