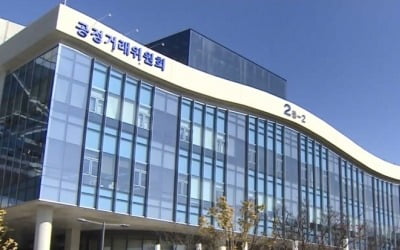[취재수첩] '지방 구인난' 기업이 한국 뜨는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정현 산업부 기자 hit@hankyung.com
![[취재수첩] '지방 구인난' 기업이 한국 뜨는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1307/02.6936201.1.jpg)
9일 서울 서초동 삼성 본사에서 만난 한 최고경영자(CEO)는 “국내에서는 증설도 쉽지 않다”며 한숨을 쉬었다. 부지도 없지만 한꺼번에 수백명의 인력을 구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취직하기 어려워도 지방, 더군다나 제조업 생산직에 취업하기를 꺼린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이유다.
인력은 오로지 서울로만 몰리고,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다. 박호환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비교한 ‘한국과 베트남의 경영 환경’을 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요인은 명확하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력의 평균연령이 베트남은 27.4세다. 반면 한국은 38.5세로 10년 이상 높다. 게다가 이 가용 인력 규모도 한국은 정체 상태지만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한정된 인력마저 ‘인(in) 서울’을 고집하니 지방 사업장은 일손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박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의 단순 생산직 인력은 9만1000명이 부족했다. 청년층이 지방 근무와 생산직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약 2만명의 생산직 인력을 신규로 채용했다. 베트남 인건비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고용률 70%’를 내건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취업난이, 다른 한편에서는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고용 상황과 노동 환경, 정부의 지원책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이 간극은 좀체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고용유연성이라도 획기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노동법을 바꿔야 한다.
수도권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획기적인 조치가 서둘러 나오지 않으면 증설해야 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치권과 경제관료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
윤정현 산업부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