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세대, 2~5년 더 직장 보장 '최대 수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막 오른 정년 60세 시대 (1) 누가 혜택 받나
임원 승진못한 간부사원, 사무직 근로자도 혜택
비정규직 박탈감 커질수도
임원 승진못한 간부사원, 사무직 근로자도 혜택
비정규직 박탈감 커질수도

이번 개정으로 권고 규정은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명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된다. 한국이 미국 영국 같은 임의정년제 국가에서 프랑스(60세), 일본(65세) 등 의무정년제 국가로 바뀐 것이다.
○‘486’세대 최대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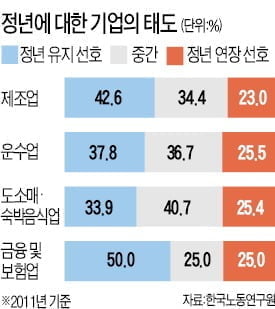
만 55세 퇴직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961년생인 근로자는 2016년에 퇴직 연령이 된다. 이 근로자가 일하는 곳이 30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 연령이 되는 그 해에 맞춰 정년이 연장된다. 연장된 정년까지 퇴직하지 않는다면 2021년까지 최대 5년 회사를 더 다닐 수 있다. 만 58세가 정년이라도 60세로 정년이 바뀌어 퇴직연령은 2년 더 늘어난다.
그러나 개정법이 정한 2016~2017년은 “이때까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라”는 가이드라인이고 그 전에 노사 합의로 미리 연장할 수도 있다. 노사합의가 빨라 올해부터 정년 60세를 시행한다면 1958년생 근로자부터 혜택을 입게 된다. 이 근로자는 원래대로라면 올해 퇴직해야 하지만 이 경우 2018년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다. 이렇게 1958~1960년생 근로자는 의무화 시기 이전에 노사합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의 또 다른 수혜자는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한 고참 간부사원이 될 전망이다. 사원으로 남아 정년 보장이라는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일손 부족 현상과 숙련인력 수요 등으로 인해 정년 이후에도 촉탁 등의 형식으로 재고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해양업종이 대표적인 예다.
○비정규직 환경 악화 우려도
법의 실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년 60세 의무 규정이 산업현장에서 안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표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평균 정년보다 실제 퇴직 연령이 3세 이상 빠른 것도 정년 이전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직장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법으로 60세가 의무화돼도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근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추가 부담을 안게 된 고용주들이 비정규직 채용 형태나 급여 등에서 ‘보완책’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년 이상을 쓰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근로자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일각에서는 정년이 대부분 60세 이상인 공공부문에서 추가 정년 연장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지난 23일 “62세인 현행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