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대전망] 일본, 금융완화 '아베노믹스' 단기 약발
엔고 해결땐 대기업 수익 개선…"실물경제엔 영향 미미" 분석도
그러나 곳곳에서 구멍이 생겼다. 우선 엔고(高)가 발목을 잡았다. 한때 달러당 75엔 선까지 엔화가치가 오르며 수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전자산업부터 둑이 무너졌다. 소니 샤프 파나소닉 등 전자 대표선수들이 줄줄이 대규모 적자대열에 합류했다. 8월부터는 영유권 분쟁이라는 덫에 걸렸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감정싸움으로 중국 내 반일시위가 촉발됐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얼어붙었다.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시중엔 경기침체가 201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일본은행은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총선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촉매가 됐다. 아베 총리는 총선 공약으로 화끈한 금융완화 방안을 내걸었다. 목표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탈출과 엔고 저지 등 두 가지로 잡았다. 수단은 간단했다. 돈을 왕창 풀어 일본경제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겠다는 것. 일본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1%에서 2%로 올리고, 추가경정예산도 10조엔(약 120조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은 바빠졌다. 갑자기 엔화가치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총선의 영향권에 있었던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만 엔화가치가 달러당 5엔가량 하락했다.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먹힌 것이다. 주식시장도 뜨거워졌다. 닛케이평균주가가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1만엔 선을 훌쩍 넘어섰다. 일본 대기업들의 최대 고민인 엔고가 해결될 경우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된 덕분이다.
막판의 반전으로 새해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은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한쪽에서는 일본 경제가 회생의 계기를 잡았다는 견해도 나온다. 히비노 다카시(日比野隆司) 다이와증권 최고경영자(CEO)는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일본 증시가 2013년 30% 가까운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일본의 부양책이 위기에 빠진 금융 시장에는 좋지만 실물경제에서는 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에노 야스나리(上野泰也)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엔화 약세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엔화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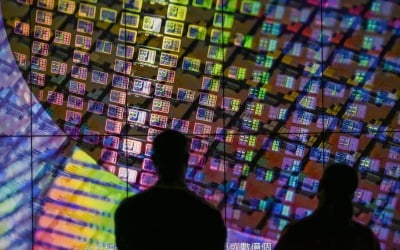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