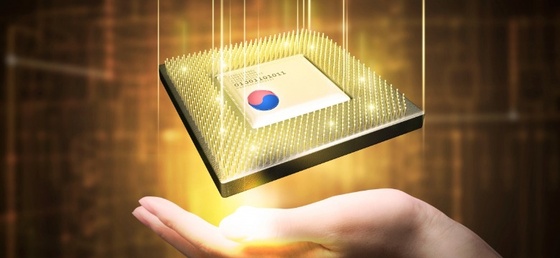[천자 칼럼] '국민생선' 명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명태로 만들 수 있는 요리만 해도 수십 가지나 된다. 내장으론 창란젓을, 알로는 명란젓을 만든다. 대가리는 귀세미김치를 만드는 데 쓰고, 꼬리와 지느러미는 볶아서 국물맛 내는 데 사용한다. 껍데기는 말렸다가 쌈을 싸먹고, 눈알도 구워 술안주로 쓴다. 명태는 이름도 많다. 갓 잡은 싱싱한 것은 생태, 얼린 것은 동태라 불린다. 겨울에 덕장에서 얼고 녹기를 스무 번 이상 반복한 것은 황태라 한다. 북어는 더덕처럼 마른 것을, 코다리는 내장과 아가미를 빼고 4~5마리를 꿰어 꾸덕꾸덕 건조한 것을 말한다. 어린 새끼를 말린 것이 노가리다.
간에서 나온 기름으로 등잔을 밝힌다고 해서 명태(明太)란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이 유력하다. 명태간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속설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명태는 열을 가하면 쉽게 풀어지기 때문에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이롭다고 전해진다. 북어국은 숙취해소를 원하는 술꾼들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좋은 음식이다. 칼슘이 많은데다 명태가 마르면서 단백질 비중이 높아져 고단백 식품이 되기 때문이다. 황태나 북어가 저칼로리 고단백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는 이유다.
명태는 한때 많이 잡힌다고 해서 산태(山太)라고도 불렸다. 청어 꽁치 등과 함께 대표적 어종으로 꼽혔다. 그러나 한반도 근처에선 명태가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해수온도상승으로 한류성 어종인 명태의 이동경로가 달라졌고, 노가리를 먹는 습성도 명태가 실종된 이유 중 하나다. 요즘 먹는 명태는 그래서 거의 다 러시아산이다. 작년 한국어선이 러시아 해역까지 가서 입어료를 내고 잡은 명태가 4만8796에 달한다. 한국해역에서 잡힌 것은 거의 없다.
러시아 해역에서 명태를 잡을 수 있는 쿼터협상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3일 시작됐다. 러시아는 캄보디아 등의 선박이 러시아에서 불법으로 게를 잡는 것을 한국이 묵인하고 있다며 쿼터배제 운운하고 있다. 한국이 불법포획된 것인 줄 알면서도 게를 수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러시아에서조차 잡지 못하게 되면 명태는 ‘금태’가 될 것이다. 간밤에 ‘쐬주’에 시달린 속을 풀어줄 북어가 사라질까 걱정이다.
조주현 논설위원 fores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선제적 아닌 '눈치보기' 통화정책…Fed는 왜 필요한가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192630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