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을 제집처럼…현장서 박사 딴다
출연硏 '현장'이 교실…교수는 베테랑 연구원
취업률 80% 넘어
올해로 개교 10년을 맞는 이 학교엔 캠퍼스가 따로 없다. 대전광역시 대덕지구에 학사업무를 담당하는 본원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정부 산하 29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가 ‘교실’ 역할을 한다. 연구소에서 전체 학점의 절반에 가까운 현장연구·실습을 통해 학위를 받는다. 지도·강의교수는 연구소의 베테랑 책임연구원들이다. 대학 교수실과 달리 문턱이 높지 않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장성록 씨(29)는 UST-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변환공학 석박사통합과정을 3년 반 만에 조기 졸업하고 지난해 12월 선임연구원으로 전기연구원에 입사했다. 그는 서울대 대학원 전기공학부에도 합격했으나 결국 UST를 택했다. 장씨는 “현실과 밀접한 실질적 연구를 대학보다 스케일이 훨씬 크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또 “지도교수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격의없이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UST-극지연구소 기후연구부에서 극지과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 중인 정선미 씨(30)는 남극을 제집처럼 오간다. 2009년 12월 러시아 쇄빙선을 타고 남미대륙 남단과 남극 사이 드레이크 해협을 한 달 동안 누비며 시료를 채취했다. 2010년 초엔 미국 쇄빙선을 타고 남극반도 동쪽 라센 빙붕(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을 조사했으며, 작년 1월엔 우리 쇄빙선 아라온호를 탔다. 다음달 초에도 남극으로 한 달간 떠날 예정이다.
그의 박사 논문 주제는 ‘홀로세(지질시대의 최후시대) 동안 발생한 기후변화 복원’이다. 춥거나 따뜻해짐에 따라 달라지는 퇴적물 내 동위원소 양상 등을 분석해 홀로세 당시의 기후를 재현하는 것이다. 그는 라센 빙붕을 조사하며 인연을 맺은 연구팀이 소재한 미 콜게이트대에서 박사후과정(Post Doc)을 진행할 예정이다.
UST 학생은 국가 전력체계를 개편할 수도 있는 거대장치를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KSTAR운영사업단 공동실험연구부에서 핵융합 및 플라즈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준영 씨(30). 2009년 이 연구소 초전도도체납품팀에서 인턴연구원을 했던 것이 UST를 택한 계기가 됐다. KSTAR은 25~30년 후 핵융합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모의실험시설이다. 그의 임무는 플라즈마를 가둬놓는 토카막(자장 용기)에서 고속 이온입자들이 얼마나 빠져나오는지를 포착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플라즈마가 수억도가량으로 가열돼야 하는데, 이온입자들이 빠져나오면 가열이 잘 안 되고 토카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시뮬레이션, 설치 및 운영, 분석 및 결과 발표까지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 책임제로 학위과정이 운영된다”고 말했다.
개교 이듬해인 2004년 121명이던 UST 재학생(석·박사)은 지난달 기준 773명(외국인 221명)으로 늘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해 후기 기준 취업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전자, LG전자, 휴맥스 등 연구소와 대기업 등을 합해 81%에 달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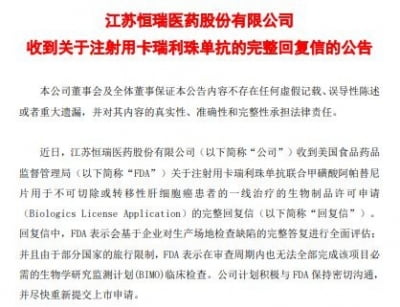




![서학개미 뒤집어졌다…다우지수 종가기준 첫 4만선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D.36579999.1.jpg)


![[단독] LG전자, 메타 대신 'XR 동맹' 새 파트너 찾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763071.1.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