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편가르기 부추기는 공익광고
공익핑계로 사적욕망 침해 안돼
그러나 관련 법에 학생 유권자가 일정 수를 넘어야만 부재자 투표함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참정권 침해가 아니라 현행 법을 개정해 달라고 투쟁해야 합당한 것이었다.
학생들의 '투쟁' 사유가 잘못 설정된 이 사태를 보면서 일부 학생들의 사고방식에 편 가르기 정서가 은연중 만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기 초 신입생들에게 게시한 벽보에 '우리가 뭉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가상의 '그들'을 전제하고 일단 '우리'는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늘 바뀔 수 있다. 때로는 학교당국이 되기도 하고,대통령이나 집권당이 되기도 하며,어떤 경우에는 특정 집단이 되기도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을 대입하여 반미감정을 고조시키는 데 한몫을 한다. 2008년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쇠고기 사태가 그러하다. 누가 그렇게 조장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늘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이른바 '투쟁동력'을 함양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 가르기 정서 함양 기법이다.
정작 중요한 논점은 편 가르기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그 명분이 늘 공적(公的) 가치에 있다는 점이다. '공익' '공공성'처럼 '공(公)' 자가 들어간다. 교육의 경우 '공교육',광고의 경우 '공익광고'이다. 요즈음 TV에 나오는 공익광고를 보면 편 가르기를 아예 국가 차원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학부모는 앞만 보라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안 준다'라고 그릇된 잣대를 설정해 놓고는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라고 대놓고 편 가르기를 종용한다.
교육학을 업으로 삼는 필자가 과문하긴 해도,부모와 학부모가 대립개념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앞을 보고 내디뎌야 멀리 볼 수 있는 것이고,나름대로 앞서 가는 사람이 있어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비몽사몽 헤매는 시간을 줄여야 원대한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다.
'공교육'이라는 개념도 잘못 설정된 것이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할 것은 공교육이 아니라 학교교육이다. '학교교육'에는 공적 기여를 하는 가치도 있지만,사적 욕망에 의한 가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우리가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내는지 생각해보면 명백해진다. 아이에게 뒤처져도 좋으니 공공의 목적에만 이끌려 살라는 부모는 온전한 부모가 아니다. 필요할 때 한눈 판다고 나무라는 부모가 정상이다. 온전한 부모를 희한한 편 가르기 논법으로 모욕하는 '공익광고'의 의도는 무엇인가?
물론 공공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근본가치이다. 그러나 편 가르기에 동원되는 '공(公)'개념은 심지어 자유민주적 질서와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 사유재산의 헌법적 가치를 왜곡하는 토지공개념은 가진 자,그렇지 않은 자를 편 가르기 한 산물이다. 오히려 당국이 그릇된 편 가르기에 편승하면서 정작 시비를 명백히 가려야 할 문제에는 이분법적 사고(思考)라고 하면서 미온적이다.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에 대한 대응은 좀더 단호해야 한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교육학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574328.3.jpg)
![[시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개혁 논제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20285039.3.jpg)
![[천자칼럼] 보물선 인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59578.3.jpg)


![뉴욕증시, 나스닥 사상 첫 17,000선 돌파마감...엔비디아 7%↑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90642359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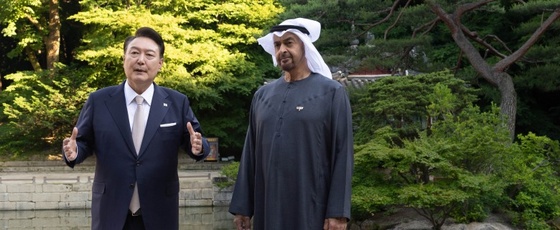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