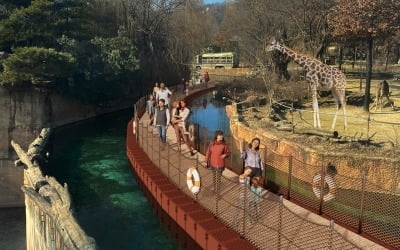이통사, 모바일기기 진화…기업시장에 사활 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끝> 비즈 트랜스포메이션 열풍
●'스마트 WAR'
●'스마트 WAR'
SK텔레콤은 왜 연초부터 정예 요원을 선발해 이색 교육을 실시하는 걸까.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 시장에서 통신 수요를 찾아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통신 그 이상'으로의 진화
'통신 기업 이후(Beyond Telco)'.글로벌 통신업체들의 과제를 담은 표현이다. 소비자 중심의 통신 서비스를 뛰어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야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고민이 담겨있다. 아이폰 등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통사 텃밭인 서비스 시장에 애플,구글,노키아 같은 글로벌업체들이 치고 들어왔다. 통신망이 없어도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수 있는 앱스토어가 발전하면서 이통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기존 통신 가입자 시장은 포화된 지 오래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 48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한 명당 휴대폰 한 대씩을 보유하고 있어 더이상 가입자를 늘리기도 어렵다.
주요 통신업체들이 대안으로 주목하는 곳이 기업시장이다. 스마트폰은 통신업체에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지만,기업용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기회도 제공한다. PC처럼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 성능 좋은 모바일기기가 쏟아지면서 다양한 기업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신업체들은 네트워킹,센싱,솔루션 등 그동안 축적한 기술로 법인,산업,공공 등 기업 시장에서 새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사업전이(business transformation)까지 꿈꾼다.
◆기업 시장에 미래 있다
KT,SK텔레콤,LG텔레콤은 올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연말 인사에서 사장실 직속 조직으로 IPE 사업단을 신설했다. 기업 시장에서 새 수요를 찾을 '산업생산성 증대(IPE · Industry Productivity Enhancement)'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0여명 남짓의 태스크포스를 200명 수준의 부문급 조직으로 확대했다. SK텔레콤은 올해 이 분야에서만 1조원,5년 뒤에는 5조원대 실적을 올리겠다는 목표도 정했다. 2020년에는 기업 시장에서만 20조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은 11조원대.이와 별도로 기업용 서비스로 20조원의 추가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개인 중심에서 기업 시장으로,이동통신에서 종합 서비스 회사로 핵심사업을 과감히 바꾸겠다는 얘기다.
LG텔레콤,데이콤,파워콤 등 통신계열 3사를 통합해 6일 공식 출범하는 통합 LG텔레콤도 기업 수요 발굴을 맡을 비즈니스솔루션본부를 만들 예정이다. 사업을 이끌 수장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지낸 고현진 LG SNS 부사장을 영입했다. KT도 유 · 무선을 통합한 기업 통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6월 KTF와 합병한 데 이어 기업고객부문을 신설했다.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등과 제휴해 자동차,조선소 등에 휴대인터넷 와이브로를 적용한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에서 M2M까지
기업 서비스 중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는 모바일 오피스 시장이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휴대폰에 설치,바깥에서도 사무실에서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삼성전자,증권,SDS 등 삼성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포스코,현대하이스코,씨티은행,LIG넥스원,대한항공,한진해운 등 주요 대기업들이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업체들의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사람 손이 닿기 어려운 기기들을 통신망과 센서로 연결해 원격 관리하는 기기 간(M2M) 통신 시장도 주목받고 있다. 기기들이 마치 사람이 전화하듯 일정한 주기로 자신의 상태를 무선망으로 보내주고 원격지에서도 현지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전기 · 가스의 원격 검침에 적용되던 것이 요즘에는 가로등 제어,기상정보 수집,해양 관측,건물이나 농사 시설 관제 분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