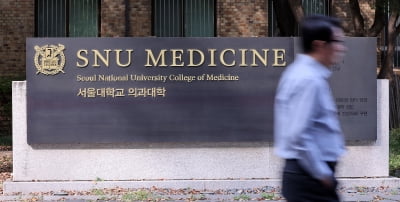우리 세종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가운영기관들이 베를린과 본으로 분산된 독일의 경우가 혼란과 비효율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 비효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본에 남겨진 부처 장관들이 거의 베를린에 머물고 있고, 베를린과 인구 30여만명인 본을 오가는 항공기 편수가 연간 5500회를 넘는다는 얘기들로부터 대략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최근에는 극심한 행정 비효율을 이유로 정부분할을 규정한 '베를린-본 상생 법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결정 근거는 '관습헌법론'이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곧 대한민국 수도의 이전이고, 이는 대한민국 성립 이전부터 역사적 · 전통적으로 '서울=수도'라는 당연한 전제와 자명한 사실에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는 국민들의 통념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수도가 가져야 할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에 관한 매우 인상적인 '수도론'이 있다. 사실 우리 수도이전에 대한 첫 언급은 오래 전인 1971년 김대중 신민당 대선 후보가 내건,행정수도를 대전으로 옮긴다는 공약이었다. 하지만 몇 년 뒤인 1977년 11월 그는 진주교도소에서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말고 다른 곳일 수 없다'고 말한다. 박정희 정권 말기 대전에 임시수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을 때였다. 최근 발간된 그의 <옥중서신1> 내용은 이렇다.
"세계의 수도는 지리적 중심이나 국왕의 편의로 정해진 게 아니라, 국토방위의 전방에서 싸우고 짓밟히고 되찾는 투쟁으로 얻어진 영광이다.
영국 동남의 런던이나,프랑스 북단의 파리는 모두 노르만인과의 투쟁, 나중에는 숙적인 상대국으로부터 국토를 지켜내기 위한 최전선(最前線)이었다. 독일 베를린은 유럽의 최대 위협이었던 러시아를 막아내고, 신성로마제국의 중심이었던 오스트리아 빈은 오스만투르크의 침공에 대항하기 위한 거점이었다. 중국 베이징은 북방민족에 대한 전방 교두보였으며 일본 도쿄는 서양세력이 밀려드는 태평양의 정면에 자리하고 있다.
반면 조선의 도읍 서울은 혹설(惑說)인 풍수사상에 의해 정해졌다. 그러나 불행한 남북분단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지금 서울은 가장 올바른 수도의 자리다. 휴전선과 겨우 25㎞ 떨어진 수도에서 정부와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가방위에 끊임없이 긴장하며 숨쉴 때,국민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솟아오를 것이다. "
대단한 통찰이다. 그렇다면 지금 세종시 논란의 근원인 행정수도 이전론에 이 같은 역사인식과 수도의 의미, 상징성에 대한 깊은 고뇌와 통찰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허울좋은 국토균형발전 논리 말고 수도이전의 철학적 · 경제적 · 사회적 · 기술적 의문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완벽한 답이 준비돼 있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명운을 좌우할 수도이전을 한낱 대통령 선거에서 '재미 좀 보기 위한' 공약으로 삼은 것만으로 솔직히 어이없는 일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헌재의 위헌판결 때 접어야 했던 것을 끝내 대못을 박은 결과가 오늘의 혼란스런 상황이다. 세종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가야할 길이 뻔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처음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면 잘못 들어선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
논설실장 kunny@hankyung.com


![[천자칼럼] 일론 머스크의 앙숙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880733.3.jpg)


![[르포] '윤석열' 지우는 대구 서문시장…"尹 욕하는게 싫어 사진 뗐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K.3887887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