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우리 밖의 타자, 우리 안의 타자
잃었던 국권의 회복은 광복(光復),즉 빛을 다시 찾은 것에 견줄 만한 기쁨이다. 그런데 8월15일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다.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었던 것 같지만 사실 '국가'는 근대의 산물이다. 그 이전은 국가보다 마을이나 도시,지역이 더 우세했다. 가령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빈치 지역의 레오나르도',잔다르크는 '아르크 지방의 잔느'라는 뜻이라니 이들의 이름에서는 지역 중심의 사고가 엿보인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각각 이탈리아인이나 프랑스인으로 불릴 뿐이다.
팀 에덴서의 책 '대중문화와 일상,그리고 민족 정체성'을 보면,대중문화와 일상에까지 스며있는 민족 정체성의 사례가 다양하게 제시된다. 가령 최근 한국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영국 자동차 '미니(Mini)'의 경우를 보자.영화 '이탈리안 잡'에서는 영국인 도둑들이 로마에 있는 은행을 털고는 작은 크기와 뛰어난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미니를 타고 탈주에 성공한다. 이탈리아의 좁은 길에서 증명되는 미니의 뛰어난 경쟁력 강조는 사실 독일 국민차였던 '비틀(Beetle)'을 이겨야 한다는 민족 감정과도 관련 있다. 빨간 공중전화 박스나 이층 버스,제임스 본드와 비틀스처럼 영국을 대변하는 아이콘이 바로 미니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의 국경은 '자본'일 정도로 점점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자본주의의 힘이 국가 권력이나 민족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자본의 이동에 따라 국경도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국민으로서의 외국인 이주노동자,탈북자,조선족 등의 존재가 부각되기도 한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100만명이 넘고,그 중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12만명이나 된다.
국경이나 경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작가 전성태의 소설 '이미테이션'에서는 부모가 한국인이지만 외국인처럼 생긴 외모로 인해 주인공이 겪는 해프닝이 재치 있게 그려진다.
그는 처음에는 차별이나 동정의 대상이었지만,오히려 그런 조건을 역이용해 영어원어민인 것처럼 연기하며 영어강사로 일한다. 하지만 '명실상부'하게 혼혈인 병역복무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오리지널 한국인도 아니고,오리지널 혼혈인도 아닌 이런 '이미테이션'인생을 사는 주인공을 통해 작가는 단일민족 국가라는 한국인의 자긍심과 영어원어민을 경배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블랙유머로 그려낸다.
이처럼 탈경계,디아스포라,다문화 등이 문제될수록 우리는 '우리 밖의 타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타자' 또한 배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을 석방하는 일에 있어서 현정은 회장을 '한국의 클린턴'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미국의 현정은'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과 남한은 서로에게 진정한 '우리' 혹은 '동족'일 수 있다.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빛의 제국'을 보면 하늘은 환한 대낮인데 집은 칠흑 같은 밤이다. 이런 빛과 어둠의 초현실적인 병치는 밖은 대낮이지만 어둠 같은 절망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타자들의 내면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인다.
분리나 배제가 아니라 연대와 공존 중심인 '우리'라는 개념의 실체가 남한과 남한,남한과 북한,한국과 일본,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도래할 때 또 다른 '광복'은 달성될 것이다. 국가나 민족 없이는 '빛'도 없다.
김미현 <문학평론가·이화여대 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내가 클 수 있는 조직으로 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609646.3.jpg)
![[토요칼럼] 저렴한 가격은 언제나 옳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897407.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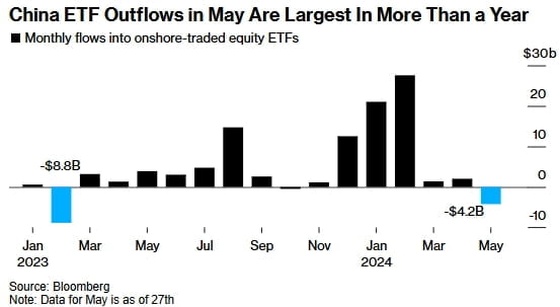








![[책마을] 아시아의 바다는 한순간도 잠잠한 적이 없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89480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