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종편.지역민방 뛰어들까
미디어법 개정으로 케이블업계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 뛰어들거나 지역민방과 겸영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케이블업계는 일단 종편 PP나 지역민방 겸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번 미디어법 개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 케이블업계 종편 설립 움직임 구체화 = 정부가 미디어법 개정을 계기로 종편 PP 사업자 신규 승인에 나섬에 따라 케이블TV업계의 종편 PP 설립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업계는 최근 수개월 간 케이블TV방송협회를 중심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함께 종편 PP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빠르면 다음 주 협회 주재로 주요 SO와 PP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종편 PP 진출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24일 "미디어법 개정으로 종편 PP 신규 승인이 가시화됨에 따라 케이블TV업계의 대응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편 PP 설립을 추진할지 그만둘지를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가 종편 PP 진출을 검토하게 된 것은 인터넷TV(IPTV)의 등장으로 플랫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케이블업계만의 경쟁력 있는 대표채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SO들의 경우 채널편성권을 갖고 있어 만약 종편 PP 설립을 승인받으면 10번, 12번 등 경쟁력 있는 채널번호를 부여할 수 있고 PP를 통해 콘텐츠 수급 등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편 PP 설립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용되고 수익성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케이블TV업계가 다른 곳에 비해 저비용으로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만큼 진지한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미디어법 개정으로 지상파와 SO의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대형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지역민방과의 짝짓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SO의 경우 지역기반 플랫폼 사업자로 지역민방과 결합하면 콘텐츠 제작이나 지역광고 영업, 양방향 서비스 등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ㆍ경기 지역에 가입자 기반이 탄탄한 씨앤엠이나 HCN, 부산 지역 중심의 CJ헬로비전, 대전 지역에 기반을 둔 CMB 등과 지역민방이 결합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막대한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데 비해 실제 시너지 효과나 수익성에 있어서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 만큼 단기간 내 구체화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 종편.보도 PP 진입 시 수익악화 우려도 상존 = 정부의 종편ㆍ보도 PP 신규 승인 방침이 케이블TV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연내 종편 PP 2개, 보도 PP 1∼2개 사업자를 새롭게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SO 입장에서는 최대 4개로 예상되는 종편ㆍ보도 PP가 모두 의무전송채널로 규정되면 채널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져 다른 플랫폼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아날로그 기반에서 SO들은 KBSㆍEBS와 같은 공영방송, KTVㆍ국회방송ㆍ방송대학TV 등 공공채널, 분야별 공익채널, YTNㆍMBN 등 기존 보도채널 등을 의무전송해야 한다.
여기에 SO에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는 홈쇼핑 채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 4개의 종편ㆍ보도 PP를 의무전송화할 경우 그만큼 다른 채널들이 편성될 여지가 작아지게 된다.
4개의 종편ㆍ보도 PP가 새롭게 들어오면 그만큼의 채널이 케이블TV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 경쟁력 없는 중소 PP가 도태될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광고수익 측면에서도 사실상 지상파와 다름없는 종편 PP의 등장은 다른 PP의 수익성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최대 4개의 종편ㆍ보도 PP가 신규 승인될 경우 의무전송채널에 관한 규정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면서 "업계 차원에서 방통위에 이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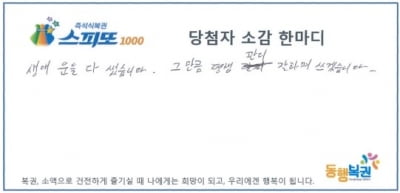
!["한국오면 꼭 먹고 가려고요"…외국인들 환장하는 '의외의 음식'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6848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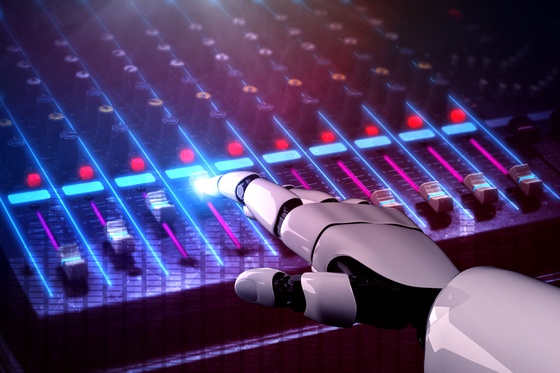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