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외이사제도 10년] 투명경영 감시 넘어 회장 선임 등에 절대적 영향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권 이사회 장각…경영의사 결정 '좌지우지'
사외이사 줄이려고 이사회 멤버 축소 부작용도
사외이사 줄이려고 이사회 멤버 축소 부작용도
기업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외환위기 직후 강화된 사외이사제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총시즌을 맞아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이 명망가나 시민단체 출신 위주로 돼 있던 사외이사를 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교체하는 등 기업 내부에서도 사외이사제도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 등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지나치게 비대해져 선임 과정과 활동 등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옥상옥'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지주 A사의 경우가 단적인 예다.
◆금융 · 공기업에선 '그들만의 리그'
A사의 회장 선임권은 사외이사들이 갖고 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멤버가 모두 사외이사다. 사외이사 선임은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임기도 3년으로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1,2년보다 길다. 이사회를 견제 · 감시하는 감사위원회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이렇다 보니 A사의 사외이사들은 '투명 경영의 조력자'가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해온 금융감독원이 최근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해 합리적 효율적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외이사 재선임 때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라"고 지시했을 정도다.
뚜렷한 지배주주 없이 지분이 분산돼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민영화 공기업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외이사들의 '월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작년 말 현재 이사회 멤버 중 사외이사 숫자는 KB금융지주가 12명 중 9명,우리금융지주 8명 중 7명,신한금융지주 15명 중 12명,하나금융지주가 15명 중 9명이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민간기업들이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보다 1~2명 정도 더두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회사 사외이사들은 회장 및 행장 선출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A사의 경우 지주회사 회장이나 행장 선임 때 사외이사들이 전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금융권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민간기업선 경영의사 결정놓고 마찰도
민간 기업들은 신속한 경영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외이사들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의 규정 강화로 인해 사외이사를 늘려 선임해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상장사 두 곳 중 한 곳이 사외이사 인원을 1명만 두기 위해 등기이사 수를 4명으로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해 상장사 1509곳을 조사한 결과 42.9%인 648개사가 사외이사를 한 명만 두고 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내이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법적 요건만 충족시키는 기업들이 많다"며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영 책임을 지는 이사회 규모만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는 관행들도 이사회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사회에 앞서 일일이 사외이사들을 찾아 다니면서 안건을 설명하는 것이 관례"라며 "사외이사들이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는 안건은 아예 이사회에 상정시키지 않고 있어 이사회에서 토론이 필요한 심각한 안건이 다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영진 흔들기에 악용되는 감사제도
사외이사 제도와 함께 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감사 제도도 기업사냥꾼들의 '경영진 흔들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감사 선임 시 대주주와 특별관계인의 의결권이 총 3%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노리고 적대적 인수 · 합병(M&A)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상장협 이원선 상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감사 선임에 대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대주주는 2대주주와 달리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시켜 의결권을 3%로 제한받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박기호/박준동/조진형 기자 khpark@hankyung.com
주총시즌을 맞아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이 명망가나 시민단체 출신 위주로 돼 있던 사외이사를 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교체하는 등 기업 내부에서도 사외이사제도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 등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지나치게 비대해져 선임 과정과 활동 등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옥상옥'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지주 A사의 경우가 단적인 예다.
◆금융 · 공기업에선 '그들만의 리그'
A사의 회장 선임권은 사외이사들이 갖고 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멤버가 모두 사외이사다. 사외이사 선임은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임기도 3년으로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1,2년보다 길다. 이사회를 견제 · 감시하는 감사위원회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이렇다 보니 A사의 사외이사들은 '투명 경영의 조력자'가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해온 금융감독원이 최근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해 합리적 효율적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외이사 재선임 때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라"고 지시했을 정도다.
뚜렷한 지배주주 없이 지분이 분산돼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민영화 공기업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외이사들의 '월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작년 말 현재 이사회 멤버 중 사외이사 숫자는 KB금융지주가 12명 중 9명,우리금융지주 8명 중 7명,신한금융지주 15명 중 12명,하나금융지주가 15명 중 9명이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민간기업들이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보다 1~2명 정도 더두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회사 사외이사들은 회장 및 행장 선출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A사의 경우 지주회사 회장이나 행장 선임 때 사외이사들이 전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금융권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민간기업선 경영의사 결정놓고 마찰도
민간 기업들은 신속한 경영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외이사들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의 규정 강화로 인해 사외이사를 늘려 선임해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상장사 두 곳 중 한 곳이 사외이사 인원을 1명만 두기 위해 등기이사 수를 4명으로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해 상장사 1509곳을 조사한 결과 42.9%인 648개사가 사외이사를 한 명만 두고 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내이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법적 요건만 충족시키는 기업들이 많다"며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영 책임을 지는 이사회 규모만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는 관행들도 이사회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사회에 앞서 일일이 사외이사들을 찾아 다니면서 안건을 설명하는 것이 관례"라며 "사외이사들이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는 안건은 아예 이사회에 상정시키지 않고 있어 이사회에서 토론이 필요한 심각한 안건이 다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영진 흔들기에 악용되는 감사제도
사외이사 제도와 함께 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감사 제도도 기업사냥꾼들의 '경영진 흔들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감사 선임 시 대주주와 특별관계인의 의결권이 총 3%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노리고 적대적 인수 · 합병(M&A)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상장협 이원선 상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감사 선임에 대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대주주는 2대주주와 달리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시켜 의결권을 3%로 제한받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박기호/박준동/조진형 기자 khpark@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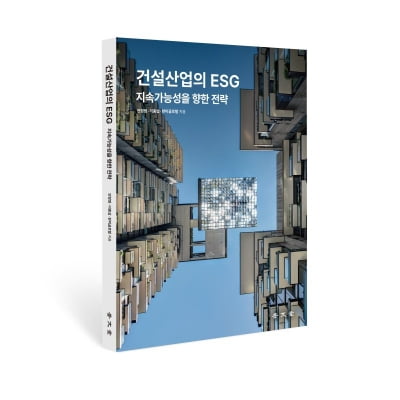
![레이싱 카트인 줄…미니 '팬층'에 제대로 어필한 전기차 [신차털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1598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