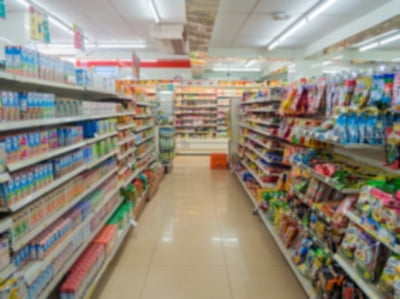[밀리언 잡] 행정인턴 A씨의 하루, 하루종일 한 일이라곤 팩스 25통 보낸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트라처럼 내실있게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여전히 인턴들을 방치해 두고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는 곳도 있는 게 현실이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 중인 A씨(30)도 마찬가지다. 그는 중견기업에서 3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뒤 해외취업을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 행정인턴을 하고 있다.
A씨의 출근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오전 9시에 출근하건,점심을 먹고 나오건 아무도 신경쓰는 사람이 없다. A씨는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게 9시 출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날 과음이라도 하면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기도 한다.
A씨의 하루는 오전에 매우 간단한 업무를 하나만 처리한 뒤 오후에는 해외취업을 위해 어학이나 실무공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5일을 예로 들면 자신이 근무 중인 팀원들이 참가하는 회의준비를 위해 엑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한 게 하루 업무의 전부였다.
지난 4일엔 부서 내에서 고장난 컴퓨터를 고쳤고,3일엔 특정업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25개 관련 기관에 팩스를 보냈다. 그걸로 끝이었다. 하루 일과가 '오전=단순 서류작업,오후=취업준비'로 요약되는 셈이다.
A씨는 "행정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한 최근 한 달 동안 일하다가 보람을 느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인턴 동기들 사이에서 인턴월급은 '우리가 괄시받는 값'이라는 말도 나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턴들 사이에선 '직함,자리,일' 등 세 가지가 없다는 의미로 '3무(無)인턴'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취업에 성공하는 것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일과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A씨처럼 부실한 인턴 프로그램의 '희생양'이 돼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인턴들도 여전히 많다.
이와 관련,취업 전문가들은 "결국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정규직 취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배치 돼 2월 말까지 두 달간 근무하다가 지금은 신송식품에 입사한 홍순희씨(31)는 행정인턴 경험을 정규직 취업으로 연결시킨 모범사례로 꼽힌다. 홍씨는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인턴경험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턴들이 팩스보내기 복사 전화받기 등 단순업무를 당연히 하지만,이것을 '쓸모 없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그는 "인턴이라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 상할까봐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했다"며 "이력서를 쓴다던가,취업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은 조직차원에서 최대한 배려해줬기 때문에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고 소개했다. 홍씨는 "사실 인턴취업 초기에는 '프로그램이 다소 부실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시간이 갈수록 개선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예를 들어 정규직 취업지원서를 낼 때 장관 추천서를 써주는데,이것도 처음에는 없던 게 생긴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행정인턴 제도가 취업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취업희망자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조귀동/송종현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