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조선시대도 '유언비어' 처벌했다
혼란기 틈타 괴소문 퍼트리면 '사형'도
사이버시대 악플 통제하는 노력 필요
우리 역사에도 유언비어(流言蜚語) 또는 거짓말 기록은 아주 많다. 며칠 전 '국민배우' 최진실씨의 죽음으로 '사이버 악플'에 대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고려사>를 거쳐 조선왕조의 <실록>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고,유언비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범법자가 사형 당한 경우도 꽤 많다.
많은 경우 이런 거짓말은 전쟁의 공포 속에 성행했다. 신라 지마왕 11년(기원 122년)에는 왜군이 쳐들어온다는 헛소문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피난했다. 그런가 하면 고려 현종 5년(1014년)에는 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짓 소문으로 나라가 떠들썩한 적도 있었다. 1604년(선조 37년)에는 왜적의 위협을 말한 사람이 효수되는가 하면,1619년(광해 11년)에는 왜적이 호남을 침범해 임실과 남원에 달했다는 헛소문이 돌아 피난민이 길을 메웠고,1638년(인조 16년)에도 왜군이 조령을 넘었다는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을 떠났다.
1624년(인조 2년)에는 어떤 사람이 "신(神)에 접했다"며 떠들다가 체포됐는데,바보스럽고 미친 듯하며 허망한 말이 입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처형됐다. 1797년(정조 21년) 5월에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철산 사람 노염이 처형됐다. 그는 종로에 대자보를 붙여 왜선(倭船)이 동래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조사 결과 그는 임금의 주목을 받아보려고 그런 짓을 한 것이라 실토했다. 하지만 포도청은 그를 형률에 따라 사형에 처했다. 지금 같으면 정신 감정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망국의 울분에 자결한 애국지사 황현(1855~1910년)은 그의 <매천야록>에 서양인들이 아이들을 잡아 삶아 먹는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집집마다 아이들 간수에 정신없었다고 쓰고 있다. 1890년 전후의 이야기다.
정말로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세상을 어지럽혔던 시기가 많았다. 당연히 정부는 유언비어를 막아보려는 조치를 취했다. 비변사나 포도청은 유언비어를 금한다는 포고문을 종로에 나붙이는 일이 많았다. 전쟁,공황,재해,정치적 혼란 등 심각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공포감은 사소한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1923년 여름 도쿄 대지진 때는 조선인이 방화하고 다닌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일도 있었다.
1938년 1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보고서를 보면 1937년의 유언비어 관련자 검거 통계가 있다. 7월 40명,8월 79명이던 것이 9월 53명,10월 34명,11월 15명,12월에는 6건 등으로 줄어갔다는 것이다. 바로 일본이 중국에 침략하면서 조선 안에서도 긴장이 고조돼 유언비어가 난무했고,일제가 이를 통제하려고 노력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시기 일제는 온갖 수단으로 유언비어 통제에 나서고 있었음을 당시 신문은 보여준다.
그래서 옛말에 '중구삭금(衆口金樂 金) 적훼쇄골(積毁鎖骨)'이라 했다. 말이 많으면 쇠를 녹이고,험담은 쌓여 뼈를 녹인다는 뜻이다. 옛날도 그랬거늘 지금 인터넷이란 요지경 속에서는 그 피해란 거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특히 벼락 성공으로 젊은 나이에 대중의 스타가 되는 경우-스포츠건 연예계건-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사이버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사이버 악플을 순화시킬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 법이 생긴다면 '최진실법'이란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다. 20년 동안 내게 즐거움을 주고 떠난 배우를 이렇게라도 기억하고 싶다. 또 그런 이름이 그녀의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역사 속에 기억할 수 있는 영예로운 수단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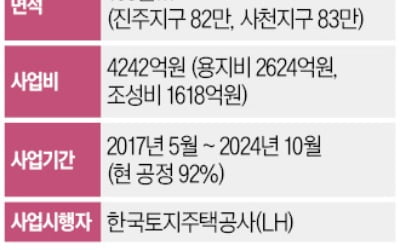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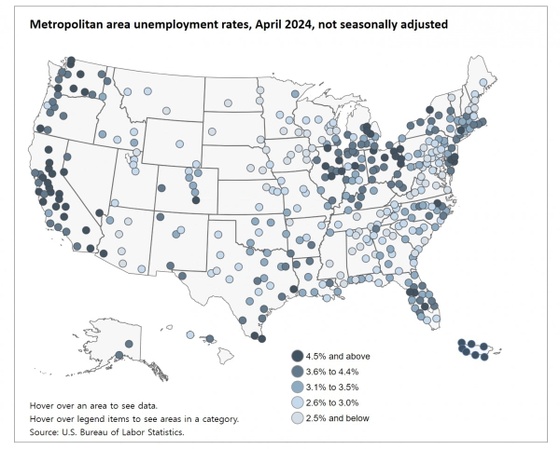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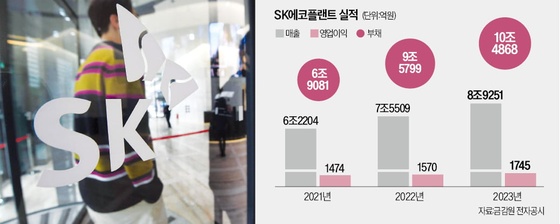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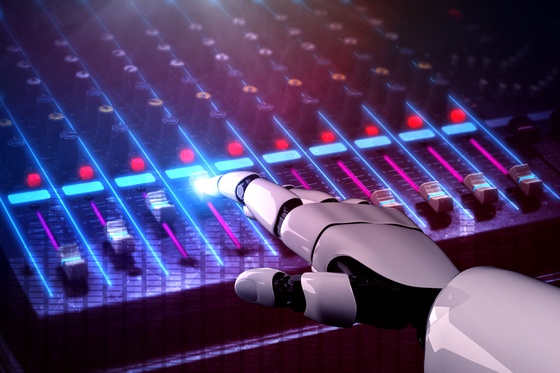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직장 생활의 지뢰 ‘맑눈광’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홍순철의 글로벌 북 트렌드]](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88397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