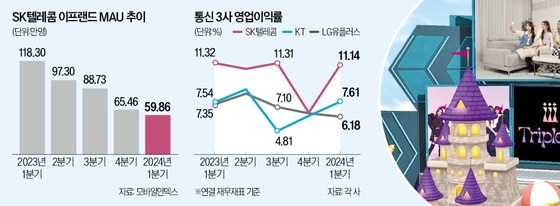금융시장 불안 … 전문가 진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실제 경제의 펀더멘털 이상으로 시장이 과민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며 환율 정책 등에서 스스로 시장 불안을 자초한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시장의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증요법과 함께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시키는 장기 처방이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필상 고려대 교수
금융시장 불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줄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연일 채권과 주식을 팔면서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달러를 벌 능력은 떨어진 반면 유출이 계속되면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가계 부문의 과도한 부채가 위험요인이며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부도 위험성도 커졌다.
제3의 요인으로는 정부 정책의 불안을 꼽을 수 있다.
정부가 환율 정책에서부터 우왕좌왕하다보니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잃게 됐고 시장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주체들이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미국 본토 상륙 우려로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이게 국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대내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 내수 침체, 물가 상승 등 부정적인 실물경제 지표가 한꺼번에 쏟아져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아울러 9월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9월 첫날에 주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터졌을 때와 비교하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실물경제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은 실물경제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재준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
수급과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서 수출업체들이 달러 매도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서 수급에서 쏠림이 발생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이탈하는 '셀 코리아' 요인도 있다.
당국으로서도 9월만이 아니라 연말 이후까지 봐야하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개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 당국은 어느 한쪽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데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오리무중'으로 시장을 관찰하다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9월 채권시장 대란설'까지의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외국인의 채권시장 이탈이 환율 상승을 유도하겠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여은정 금융연구원 금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증시 폭락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부진이 큰 원인이다.
여기에 환율이 급등하니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둔화되고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된 상태라고 보인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되는 것 같다.
결국 투자 심리 악화와 환율 상승, 기업의 수익성 악화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우선 미국에서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브프라임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안정되고 주식 시장도 동반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엔 힘들고 당분간 변동성이 클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김호준 이준서 기자 sisyphe@yna.co.krhojun@yna.co.krjun@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6월 열흘간 무역적자 8억달러…반도체·석유제품 수출↑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522620.3.jpg)



![뉴욕증시 또 사상 최고…AI 베일 벗은 애플은 1.91% 하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1062607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