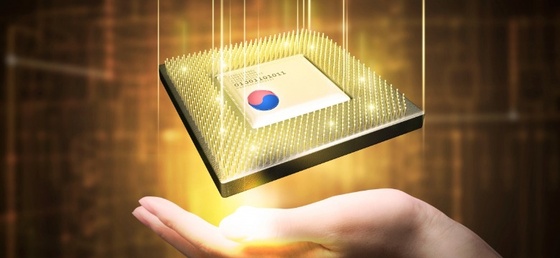[한경포럼] 알프스에서의 탈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황급히 도망치다가 생소한 곳으로 내몰렸다.
강한 눈보라 속에 기온마저 떨어져 얼어죽을 판이었지만 길을 몰라 어쩔줄 몰랐다.
절체절명의 순간,한 병사가 주머니에서 지도 한 장을 발견했다.
소대원들은 이 지도를 갖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병영으로 돌아온 뒤 소대원들은 지도를 재검토했다.
자세히 보니 알프스에서 400마일이나 떨어진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다.
칼 와익(Karl Weick) 미국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 일화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 겁에 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설사 틀린 방향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라도 갖고 있다면 사태를 파악하고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 점에서 보면 엉뚱한 지도야말로 소대원들에게 없던 길도 찾을 수 있게 한 모멘텀이었던 셈이다.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보니 어떤 상품이 인기를 얻을지 종잡을 수 없게됐다.
애플이 아이팟으로 대박을 터뜨릴지 누가 알았겠는가.
반면 초우량기업이라도 순간에 몰락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당장 돈벌이가 잘 되는 핵심사업에 너무 의존하는 행태가 꼭 필요한 변신을 막는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기업들마다 내년 경영계획을 보완하느라 부산하다.
환율 유가 대선 등의 변수로 인해 세부내용을 결정하기가 예년보다 더욱 힘들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재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지금까지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앞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각오 아래 새롭고 유연한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방식만 고집할 일은 더욱 아니다.
실행에 앞서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면 무모한 도전으로 인한 위험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자칫 실기할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시장,산업 등 각종 경계가 무너지고 기술혁신이 늘 이뤄지는 등 초경쟁시대를 맞아 살아남기 위해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어야 할 기업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실험이나 시도 등을 통해 계획을 발견하는 '행동선행적 경영'(Doing first practices)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와익 교수의 충고다.
한마디로 "고도로 불명확한 영역에서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면 살펴보기 전에 뛰어오르라"라는 주문이다.
물론 무턱대고 행동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목표를 향한 방향을 대충 잡았다면 과감히 첫 발을 떼되 한번에 너무 멀리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효과의 유무를 평가한 뒤 방향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임기응변력과 함께 실패를 용인하고 격려하는 조직문화가 요구된다.
이런 난제를 일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와 같은 행동촉발제를 찾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과제일 성 싶다.
최승욱 논설위원 swcho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선제적 아닌 '눈치보기' 통화정책…Fed는 왜 필요한가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192630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