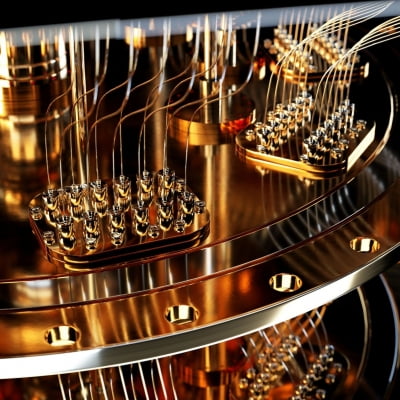소련의 석탄 광부 스타하노프(1906∼1977)가 1935년 8월31일 불과 5시간45분 만에 102t(자기 노르마의 14.5배)을 채굴하고 9월에는 1교대 시간에 227t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자 스탈린은 그를 노동영웅으로 치켜세웠다.
그를 따르자는 스타하노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노르마 초과 달성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올랐다.
이야기가 해외로 알려져 그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인물이 되었다.
스타하노프의 인생이 달라졌다.
고속 승진을 거듭해 광산 경영 책임직을 맡았을 뿐 아니라 소련 최고 인민대표회의 의원 피선,두 번의 레닌 훈장 등 다수의 포상 등 명예를 누리다 1974년 은퇴했다.
통제경제 아래에서는 사람을 부리는 인센티브가 메달 등과 같은 명예 수여이다.
명예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실물적 보상(주거,고급 상품 지급)이 따른다.
국민 대다수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사실상 시장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작은 물질적 보상이라도 위력은 막강하고 충성심을 다진다.
평양사람들 가슴팍에 주렁주렁 달린 메달도 그러할 것이다.
주로 임금 이윤 등 금전적 인센티브의 작동에 의존하는 시장경제에서도 사회가 개인의 업적을 공인하는 훈장 제도의 유효성을 부인할 수 없다.
자유세계의 수상자들도 프랑스의 최고 영예인 레종 도뇌르 훈장,영국의 OBE(대영제국 훈장) 등의 무게를 느낀다.
경제의 수레바퀴는 사람이 돌린다.
경제인을 신나게 움직이게 하려면 시장경제 체제처럼 주로 금전적 보상이거나 통제경제 아래처럼 주로 상징적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양자가 적절하게 배합되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서울에서 한때 돈,명예,권력의 삼분법 주장이 나돌았고,정부가 바뀔 때마다 초기에는 참신과 청렴을 위장한 집권세력들이 그 삼분법을 지킬 듯 품새를 잡다가 곧 제풀에 허물어지곤 하는 꼴이 반복되었다.
삼분법은 정치계에서 지켜져야 할 바람직한 원칙일 것이다.
그래야 투명한 선진사회가 된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는 권력은 빼고 돈과 명예의 배합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날 권위주의 시대에는 수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정부가 기업 또는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산업훈장제도,근로자들 포상제도가 유효하게 작동되었기에 고도성장이 가능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지 않듯이,기업도 이윤만 먹고 살지 못한다.
요즘 기업은 공동체로부터 일자리 제공,조세 납부,환경보호,이웃 돕기 등 사회공헌을 인정받아야 번영한다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근래 한국 기업의 투자의욕이 왜 활기를 잃고 시들고 있는가? 그것은 근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무게 때문이 아니다. 보다 원초적인 원인은 기업에 돈은 있으되 명예는 없도록 불명예의 멍에를 씌운다는 데 있다.
환란 이후 재무구조 개선에 전력투구한 나머지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사내 유보 유동성이 넉넉하다.
환란 직후와는 판이하게 부채비율이 낮아져 투자 가용 재원이 넉넉하다 못해 넘쳐난다.
그런데도 설비투자가 부진하다.
그 탓은 잦은 노사 분규,과도한 규제 등에도 있지만 기업인들의 의욕 감퇴에 큰 책임이 돌아간다.
하기야 기업인의 자업자득 탓도 크다.
정경유착,편법,탈세,수뢰,조폭 흉내내기 등 죄목이 길다.
한국처럼 급변하는 정치경제 풍토를 무시하고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면 '개혁' 서슬에 죄인을 양산하게 된다.
교도소 담장 밖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하나?
기업인들 목에 씌어 있는 불명예의 멍에를 벗겨주는 소극적인 일에서부터 기업가치 신장,사회공헌 등 공적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분위기 전환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현 정부 핵심 세력은 기업은 두들겨야 잘 도는 팽이를 닮았다고 보고 있다.
역사는 스타하노프를 닮으라는 노동 독려의 채찍질이 지나쳐 체제 붕괴를 가져왔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장래에 돈만 있고 저명인사가 된다는 기대가 없었다면 빌 게이츠는 없었을 것이다.
한국 경제 부활의 지름길은 경제인에게 명예심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韓 경제 골든타임 3개월…'폴리티컬 디스카운트' 해결해야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19263091.3.jpg)
![[한경에세이] 법에 갇힌 '쌀의 위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910847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