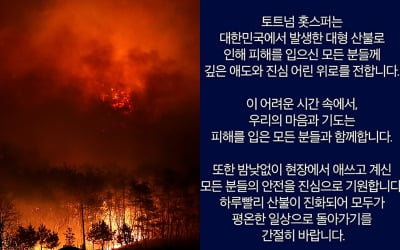재산세 강북이 여전히 더 많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선심성'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방세법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이미 탄력세율을 적용,세금을 깎아줬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재산세 역전현상'은 올해도 여전할 전망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구별되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를 별도 내야 한다.
18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해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탄력세율을 적용,세율을 최고 50% 내려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은 단순히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는 더이상 재산세를 깎아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덜 낸 지역의 주민들은 올해를 포함,향후 몇 년간 '탄력세율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은 5%,3억~6억원 주택은 10%,6억원 이상 주택은 50%의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있긴 하지만 재산세 부과액이 직전 연도 납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다 보니 전년도 탄력세율 적용으로 납부액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곳은 올해 인상폭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종부세 대상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 사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6400만원에서 올해 9억8400만원으로 48% 뛴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55만6000원)보다 50% 오르더라도 83만4000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탄력세율 50%를 적용했다.
반면 공시가격이 6억2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29% 오른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63평형은 강남구 은마아파트보다 공시가격과 가격 상승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마아파트보다 많은 최대 174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 지역은 지난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받지 않았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현행 제도로는 재산세 역전현상을 한번에 바로잡기 힘들다"며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상당기간 재산세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해 강남구 등 20곳은 탄력세율을 적용한 반면 세수가 부족하고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대문구 등 5곳은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구별되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를 별도 내야 한다.
ADVERTISEMENT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은 단순히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는 더이상 재산세를 깎아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덜 낸 지역의 주민들은 올해를 포함,향후 몇 년간 '탄력세율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ADVERTISEMENT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종부세 대상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 사례'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6400만원에서 올해 9억8400만원으로 48% 뛴 강남구 은마아파트 34평형의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55만6000원)보다 50% 오르더라도 83만4000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탄력세율 50%를 적용했다.
ADVERTISEMENT
이 지역은 지난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받지 않았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현행 제도로는 재산세 역전현상을 한번에 바로잡기 힘들다"며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상당기간 재산세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속보] 경찰, 전농 트랙터 경복궁 인근 행진 일부 허용…견인 18시간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ZA.39946390.3.jpg)